[김갑식의 오늘과 내일]트럼프와 별(★)들의 전쟁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트럼프, 내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서로 일을 바꾸면 어떻겠나. 당신은 시청률에서 대단한 전문가이니 TV를 맡고, 나는 당신의 일(대통령)을 하면 된다. 그럼, 사람들이 다시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 거다.”
배우 출신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며 한때 대권(大權)까지 꿈꾼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말이다. 이에 앞서 반(反)이민 정책으로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자신이 공동 제작했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에 대해 “슈워제네거를 후임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재앙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트럼프와 별들의 갈등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할리우드에서 외국인과 이방인을 모두 축출한다면 아마도 예술이 아닌 풋볼이나 격투기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가장 과대평가된 여배우’라는 트럼프의 반격이 이어졌다.
이런 장면들을 지켜보면 심사가 좀 복잡해진다. 흥미롭다는 느낌을 넘어 놀랍고 부럽다. 그 놀라움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쥔 미 대통령과 화려한 ‘말의 전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세계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트럼프와 ‘맞짱’ 뜨는 것 자체가 낯설다. 부러움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의 품위와 유머에서 나온다. 유머와 가시가 적당하게 버무려진 말들은 곱씹는 재미까지 느끼게 한다. 당신과 내 일을 바꾸자니.
미국에서 권력과 스타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개봉된 영화 ‘트럼보’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영화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던 매카시즘을 다뤘다. 1급 시나리오 작가였던 돌턴 트럼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블랙리스트에 올라 할리우드에서 내쫓긴다. 그는 11개의 가명으로 시나리오를 써야 했고, 그중 한 작품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로마의 휴일’이다.
씁쓸한 얘기지만 꽤 오랜 시간이 흐른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대통령 탄핵의 한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다. 왜 대통령과 정권 실세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
또 하나, 권력의 힘만 있다면 문화적 흐름이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이다. 실제 콕 찍어 블랙리스트는 아니더라도 역대 정권은 문화·예술계를 향해 자신의 입맛에 맞추라며 돈과 인사라는 무기를 휘둘렀다. 참여정부의 코드 인사와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진보 인사 솎아내기가 그랬다. 대통령은 과거에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팔 걷고, 더욱 치밀하거나 졸렬하게 블랙리스트에 매달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가 생물(生物)이라면 문화는 흐르는 물이다. 문화의 본성은 자유로움이다. 권력의 입장에서 때로 못마땅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문화의 꽃은 핀다.
곧 다가올 그래미상과 아카데미 시상식, 별(★)들의 말말말이 기다려진다.
오늘과 내일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고양이 눈
구독
-

기고
구독
-

이진형의 뇌, 우리 속의 우주
구독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
3
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
4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5
이재용 차에서 포착된 음료수…전해질 많다는 ‘이것’이었다
-
6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7
미국 스타였던 스키 여제, 중국 대표로 올림픽 나선다
-
8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시위 강경 진압에 분노 확산… 이란 ‘하메네이 체제’ 흔들
-
9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기다리는 듯”…29일 결론 가능성
-
10
[단독]통일교측 “행사에 尹 와주면 최소 10만달러”…실제로 갔다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6
李대통령, 직접 훈장 들고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
7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8
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
9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10
李,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
3
與서 김어준 저격 “정치의도 담긴 여론조사는 위험”
-
4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5
이재용 차에서 포착된 음료수…전해질 많다는 ‘이것’이었다
-
6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7
미국 스타였던 스키 여제, 중국 대표로 올림픽 나선다
-
8
[신문과 놀자!/피플 in 뉴스]시위 강경 진압에 분노 확산… 이란 ‘하메네이 체제’ 흔들
-
9
국힘 지도부 “한동훈, 제명 확정 기다리는 듯”…29일 결론 가능성
-
10
[단독]통일교측 “행사에 尹 와주면 최소 10만달러”…실제로 갔다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6
李대통령, 직접 훈장 들고 이해찬 前총리 빈소 조문
-
7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8
이해찬 前 총리 시신 운구 절차 완료…27일 오전 한국 도착
-
9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10
李, 사흘간 SNS에 정책 메시지 잇달아 9개… 직접 소통 나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오늘과 내일/윤완준]계엄의 밤 진실 감춘 한덕수의 6개월](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27/133245023.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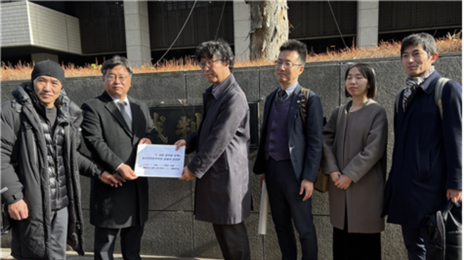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