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114>卷三. 覇王의 길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34분
글자크기 설정

“남전 북쪽 골짜기에 적의 대군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패상(覇上)에서 수만 군사가 구원을 와서 우리보다 작지 않은 군세라고 들었습니다.”
미리부터 사람을 풀어 진군(秦軍)의 움직임을 차분히 살피고 있던 장량이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패공 유방에게 일렀다. 적이 대군이란 말에 유방은 적지 아니 긴장했다. 걱정스러운 눈길로 장량을 마주보며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쯤에서 진채를 내리고 적의 대군에 맞설 채비를 해야 되지 않겠소?”
“하지만 행군을 멈추고 새삼 진세까지 펼치실 것은 없습니다. 비록 적의 머릿수는 많으나 무관, 요관이 잇따라 떨어진 터라 은근히 겁을 먹은 군사들입니다. 용맹한 장수를 앞세워 한 번 더 기세를 꺾은 뒤에 남은 대군을 들어 한꺼번에 밀어붙이면 적군은 틀림없이 뭉그러져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장량이 알듯 말듯하게 웃음기를 띠며 그렇게 받고는 주변에 둘러선 장수들을 돌아보았다.
그때 유방의 장수들은 관중(關中)으로 든 뒤의 잇단 승리에 취해 기세가 한껏 올라 있었다. 전날 남전 남쪽의 싸움이 수월했던 터라 한껏 용맹을 뽐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듯 서로 앞장을 서려했다. 그들 중에서도 번쾌가 큰 칼을 뽑아들고 달려 나와 말했다.
“무관(武關) 이래 싸움에 앞장서 본 적이 없으니 이번에는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갑주로 온몸을 가린 관영(灌영)이 질세라 말을 몰아 번쾌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현성군(賢成君·당시 번쾌의 봉호)께서는 패공을 지켜야 하니 내게 선봉을 미뤄주시오. 나야말로 남양(南陽)의 싸움 이래 이렇다 할 공을 세운 바 없어 때를 기다려 왔소.”
그리고는 패공에게 두 손을 모아 군례를 바치더니 허락도 받지 않고 말 배에 박차를 가해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적진에서 한 장수가 말을 몰아 마주쳐 나오며 소리쳤다.
“나는 대진(大秦)의 장군 주괴다. 다가오는 적장은 이름을 밝혀라!”
“요관을 팔아먹으려다 한밤중에 놀라 달아난 백정 놈의 아들이로구나. 나는 대초(大楚)의 기장(騎將) 관영이다!”
“난리통에 출세한 수양현(휴陽縣)의 비단 장수 놈이로구나. 내 네놈의 멱을 따주겠다!”
싸우고 쫓기는 동안에 얻어들은 것인 듯 주괴도 그렇게 관영을 아는 체했다. 하지만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서로의 밑천을 들추는 사이에 감정이 격해진 탓인지 둘은 말이 엇갈리자마자 창칼을 휘둘러 격렬하게 맞붙었다.
관영과 주괴의 싸움이 한창 불을 뿜는데 다시 적진에서 두 장수가 말을 달려 뛰쳐나왔다. 주괴의 부장(副將) 한영과 사마(司馬) 경패였다. 특히 경패의 말이 빨라 때마침 적진을 등지고 싸우는 관영의 등 뒤로 다가가는 기세가 보기에 몹시 위태로웠다.
“어딜….”
호분령(虎賁令) 주발(周勃)이 코웃음과 함께 강한 활에 살을 먹여 시위를 당겼다. 시위소리와 함께 바람같이 날아간 화살은 그대로 경패의 목줄기를 꿰뚫어 놓았다. 경패가 구슬픈 비명과 함께 말에서 굴러 떨어지자 뒤따라오던 한영이 주춤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초대석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장남 위장전입 의혹에…이혜훈 “결혼 직후 관계 깨져 우리와 살아”
-
4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9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
10
이혜훈 “비망록 내가 쓴것 아냐…누군가 짐작·소문 버무린 것”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장남 위장전입 의혹에…이혜훈 “결혼 직후 관계 깨져 우리와 살아”
-
4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9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
10
이혜훈 “비망록 내가 쓴것 아냐…누군가 짐작·소문 버무린 것”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三. 覇王의 길](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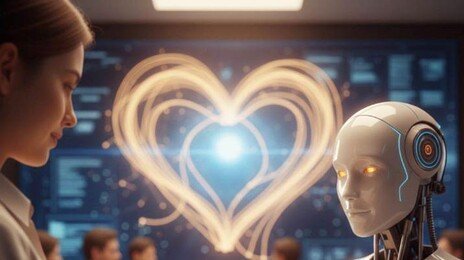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