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코끼리가 너무 많아!” 아프리카 지역 10년간 폭증
-
입력 2005년 11월 18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아프리카코끼리’(사진)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프리카코끼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 위기에 놓인 대표적 보호 동물.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그 수가 폭증해 이제는 도살 대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자연 파괴자로 변신=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1994년 이후 코끼리 보호를 위해 ‘코끼리 사냥 금지 및 상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유의 희고 큰 상아를 노린 밀렵이 기승을 부려 1980년 120여만 마리에서 1990년 50여만 마리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10년 만에 바뀌었다. 보호조치 덕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코끼리 떼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애써 키운 농작물을 망치는 주범으로 등장한 것이다.
가령 남아프리카공화국 크루거 국립공원 내에서만 1990년대 초 7000마리에서 올해 10월 말 1만3000마리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이들은 수천 년 자란 바오바브나무를 마구 먹어 치워 목초지를 황량한 초원으로 바꾸고 독수리, 코뿔새의 둥지를 빼앗는 ‘무법자’ 노릇을 했다.
남아프리카의 국립공원들은 “다른 동식물을 살리기 위해 코끼리 도살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코끼리 스스로도 생존 위협에 시달린다. 짐바브웨 정부는 7일 50마리의 코끼리가 물과 먹이 부족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강제 이주, 피임도 고려=그러나 도살 반대론자들도 적지 않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남아프리카지부는 “코끼리가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도살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남아프리카 지부도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코끼리가 자연 조절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끼리가 이처럼 골칫거리로 변한 것은 엄청난 식성과 긴 수명에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동물은 자연에서는 60∼65년을 살지만 사육 상태에서는 80년 이상을 살며 4년마다 1마리씩 새끼를 낳는다. 암컷 1마리당 십수 마리를 낳는 셈이다.
이 때문에 코끼리 피임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남아공의 마카랄리 동물원은 2년 전부터 코끼리 암컷에게 호르몬을 투여해 임신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문제는 이 피임법의 성공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호갑 기자 gdt@donga.com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5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8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2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3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4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5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6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7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8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
9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10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7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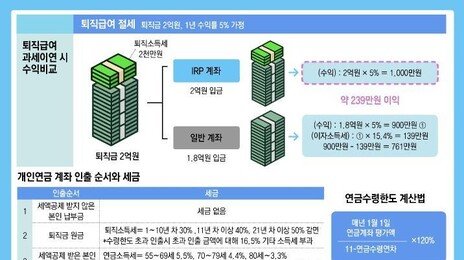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