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권순활]상전 많은 한국기업
-
입력 2005년 11월 1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민간기업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조직이다. 실력 리더십 조직충성도를 끊임없이 검증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속 도태(淘汰)가 이뤄진다.
기업은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자주 동네북이 되고 규모가 커질수록 더 그렇다. 어느 조직보다 처절하게 고민하고 국제경쟁력도 높다는 현실은 자주 잊혀진다.
권력이 시장(市場)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정당 중 하나만 나서도 손발 다 드는 곳이 한국이다. 기업의 위력이 국가 권력보다 강하다는 말은 선진국에서도 무의미한 통계 숫자에 근거한 허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존 미클스웨이트&에이드리언 울드리지, ‘기업의 역사’)
우리 기업은 상전(上典)이 너무 많다. 북돋고 격려하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쪽박을 깨기 일쑤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봉으로 여겨 준조세를 뜯어 간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리기보다 주눅 들게 만드는 현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신(新)주류 세력의 하나인 일부 시민단체는 부쩍 입김이 강해진 상전이다. 요즘은 정통 관료보다 더 힘이 셀 때도 많다. 출범 때의 초심(初心)을 찾긴 힘들다.
기업 임원 A 씨는 귀띔했다. “시민단체 인사가 관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정례적으로 두 명씩 보냅니다. 한 번에 1인당 500만 원씩 내지만 안 보낼 수 있나요?”
권력과 가까운 단체의 후원회나 세미나 지원 요청을 받고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드물다. 시민단체와 연(緣)을 맺은 교수가 몸담은 대학의 후원금이 늘었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단체의 주도적 인사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만나 접대한다.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한자리했을 시민운동가 출신 이석연 변호사가 경고하는 ‘권력화된 운동꾼 중심 시민단체’의 폐해를 느끼는 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물론 재계도 책임이 적지 않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물의는 반(反)기업정서를 부채질한다. 과거 관행이란 말로 덮고 갈 수도 없다.
하지만 흑백의 관념적 근본주의에 입각해 복잡한 세상을 읽는 것은 더 위험하다. 마음속 거울에 비추어 서슴없이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무오류의 판관(判官)’도 드물다. 흠이 없진 않겠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유난히 문제가 많다는 주장은 얼마나 검증된 것일까. 대기업을 매도하는 집단과 비판을 받는 기업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사회 기여도가 더 클까.
동양의 고전 대학(大學)에서는 ‘생산하는 사람이 많고, 하는 일 없이 먹는 사람이 적으면 재물은 항상 풍족해진다(생지자중 식지자과 즉재항족의·生之者衆 食之者寡 則財恒足矣)’고 했다. 한국호(號)의 불안은 힘써 일하는 집단의 어깨는 갈수록 처지는 반면, 창조적 생산과 동떨어진 세력이 득세하는 데도 원인이 있다. 생산의 핵심 주체인 기업을 짓누르는 상전이 줄어들수록 그만큼 희망도 커진다.
권순활 경제부 차장 shkwon@donga.com
광화문에서 >
-

초대석
구독
-

컬처연구소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트렌드뉴스
-
1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4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1년간 주 15시간 근무 땐 보장
-
5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6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7
英기지 내어주고 佛해군 파견…‘이란 공습’에 유럽 가세
-
8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9
하메네이 제거하고 중국 오는 트럼프…시진핑 웃을 수 있나
-
10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모두 불태우겠다”
-
1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2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3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4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5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6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7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
8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9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트렌드뉴스
-
1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4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1년간 주 15시간 근무 땐 보장
-
5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6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7
英기지 내어주고 佛해군 파견…‘이란 공습’에 유럽 가세
-
8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9
하메네이 제거하고 중국 오는 트럼프…시진핑 웃을 수 있나
-
10
이란 “호르무즈 통과 선박 모두 불태우겠다”
-
1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2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3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4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5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6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7
순방 가서도 ‘부동산’…李 “韓 집값 걱정? 고민 않도록 하겠다”
-
8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9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민우]유리 지갑 속 세금도 K자 양극화 탈출해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3/02/133450309.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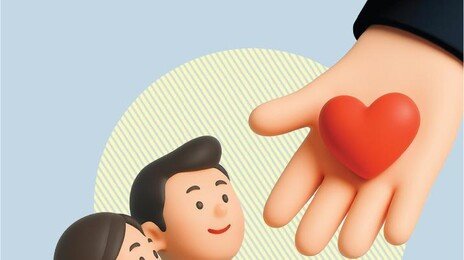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