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로맹 가리 소설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 이르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8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탄생 100주년 佛작가 기려 ‘로맹 가리 낭독의 밤’ 열려

“로맹 가리의 소설은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요.”(소설가 조경란)
“뭔가에 쫓기거나 현실에 묻혀 소설로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났을 때 로맹 가리를 펼쳐 듭니다.”(소설가 함정임)
프랑스 소설가 로맹 가리(1914∼1980)의 탄생 100주년을 낭독으로 기리는 밤. 26일 서울 중구 칠패로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로맹 가리 낭독의 밤’이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서평가 금정연은 “오늘 밤은 로맹 가리가 주인공이지만 그만이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글에 로맹 가리의 흔적을 남긴 소설가 이승우(55) 함정임(50) 조경란(45)이 낭독자로 나섰다. 이승우는 자신의 장편 ‘한낮의 시선’에 로맹 가리를 인용했고, 함정임은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읽고 페루로 떠난 뒤 이 경험을 글로 풀었다. 조경란은 ‘자기 앞의 생’ 한국어판의 해설을 썼다. 이날 주한프랑스문화원은 독자 15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문학동네 인터넷카페와 인터넷서점을 통해 이날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해서 선발된 이들이다.
이승우는 ‘솔로몬 왕의 고뇌’에서 왕년에 잘나갔던 샹송 가수 마드무아젤 코라가 내면을 고백하는 장면을 낭송했다.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마지막 소설이다. “‘진지하긴 하지만 재미없는 소설을 쓰는 작가’ 같은 말이 붙으면 벗어나기가 어렵죠.(웃음) 필명으로 글을 쓰면 이승우라는 선입견을 벗고 보니까 독자에게 다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맹 가리에게도 그런 안경을 벗게 할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겠지요.”
함정임은 ‘자기 앞의 생’에서 꼬마 모모가 동네 할아버지에게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부분을 골랐다. 모모는 로자 아줌마에게 위탁돼 성장한다. 함정임 자신이 한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남편과 사별한 뒤 아들을 데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한동안 지낸 적이 있다. “아비 없는 막내가 가진 불안감, 어미가 돼선 싱글맘으로 지냈기에 이 소설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로맹 가리를 읽다 보면 ‘(나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5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6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7
[단독]‘국보’로 거듭난 日 배우 구로카와 소야…“올해 한국 작품 출연”
-
8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9
영덕 풍력발전기 갑자기 쓰러져 도로 덮쳐…인명 피해 없어
-
10
李대통령, ‘골든’ 그래미 수상에 “K팝 역사 새로 썼다…뜨거운 축하”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5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6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7
[단독]‘국보’로 거듭난 日 배우 구로카와 소야…“올해 한국 작품 출연”
-
8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9
영덕 풍력발전기 갑자기 쓰러져 도로 덮쳐…인명 피해 없어
-
10
李대통령, ‘골든’ 그래미 수상에 “K팝 역사 새로 썼다…뜨거운 축하”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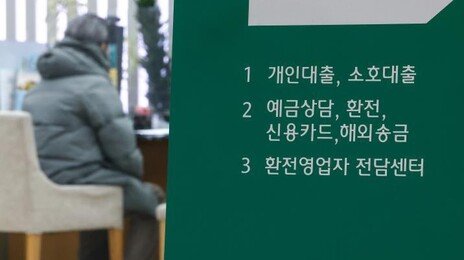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