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헤밍웨이를 위하여’ 펴낸 김욱동 교수, 헤밍웨이 작품 제대로 이해하려면…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굴곡의 개인사-여성편력 알아야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의 책이 올해 잇따라 출간됐다. 사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해 말 끝났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적 헤밍웨이 번역자로 꼽히는 김욱동 서강대 명예교수 겸 한국외국어대 통번역학과 교수(64)가 최근 헤밍웨이 설명서라 할 만한 ‘헤밍웨이를 위하여’(이숲·사진)를 펴냈다. 헤밍웨이의 삶과 대표작을 100여 장의 사진과 함께 밀도 있게 소개했다.
김 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헤밍웨이의 삶을 알지 않고는 그의 작품 속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헤밍웨이의 작품은 모두 그의 파란만장했던 개인사, 특히 화려한 여성 편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여 잘 있거라’의 여주인공 캐서린은 헤밍웨이의 첫 사랑인 쿠로스키가 모델이지요.”
그는 헤밍웨이에 대해 “삶의 정수를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표현하는 작가”라고 요약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헤밍웨이는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고 믿었다. 그의 작품 속 주인공들은 아름답지도 희망적이지도 않은 삶이어도 최선을 다해 산다.
김 교수는 헤밍웨이 특유의 건조하고 간결한 하드보일드(hard-boiled) 문체를 우리말로 옮기는 게 힘들었다고 했다. 감정을 헤프게 드러내지 않고도 작가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것이다. “헤밍웨이는 ‘소설은 건축물이다. 그런데 (화려한) 바로크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건축에 빗대 말하자면 명동성당이 아니라 63빌딩입니다. 화려함을 걷어낸 모더니즘 양식을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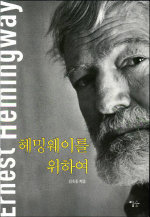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자다 소변보러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 아닌 ‘이 문제’?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이란 “첨단무기 손도 안댔다” 트럼프 “영원히 전쟁 가능”…장기전 가나
-
8
“어서 타”, 이번엔 김승연…美-이란전쟁에 ‘회장님 밈’ 방산주로
-
9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2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3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4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5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6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7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10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트렌드뉴스
-
1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자다 소변보러 화장실 ‘들락날락’…전립선 아닌 ‘이 문제’?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6
국힘 또 ‘징계 정치’… 한동훈과 대구行 8명 윤리위 제소
-
7
이란 “첨단무기 손도 안댔다” 트럼프 “영원히 전쟁 가능”…장기전 가나
-
8
“어서 타”, 이번엔 김승연…美-이란전쟁에 ‘회장님 밈’ 방산주로
-
9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10
李 “필리핀 대통령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
1
“혁명수비대 업은 강경파” vs “빈살만식 개혁 가능”…하메네이 차남 엇갈린 평가
-
2
주가 폭락에…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
-
3
“한국 교회 큰 위기…설교 강단서 복음의 본질 회복해야”
-
4
“美, 하메네이처럼 김정은 제거 어렵다…北, 한국에 핵무기 쏠 위험”
-
5
李 “檢 수사·기소권으로 증거조작…강도·살인보다 나쁜 짓”
-
6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7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
8
정청래 “조희대,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 사퇴도 타이밍 있다”
-
9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10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