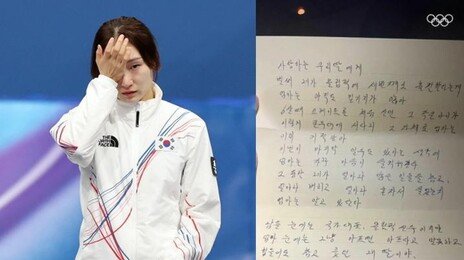공유하기
[소설]하일지판 아라비안 나이트(678)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글자크기 설정

다시 바위가 닫히자 도적들은 저마다 말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온 길로 되돌아갔다.
그 무시무시한 도적의 무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알리바바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숲속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서야 그는 살금살금 나무에서 내려왔다. 지상으로 내려온 그는 우선 온몸을 푸들푸들 떨면서 오줌을 누었다. 오줌을 다 누고 났을 때서야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바위 앞으로 다가가 보았다.
알리바바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바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눈을 닦고 살펴보아도 그것이 갈라졌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끼가 낀 그 커다란 바위 위에는 바늘구멍만한 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마흔 명의 도적들이 들어갔다 나온 것이 여기가 틀림없어. 그들이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단 말야. 그런데도 이 바위 위에는 개미 한마리 들어갔다 나온 흔적도 남아 있지가 않아.”
이렇게 중얼거리고 난 알리바바는 잠시 후 다시 중얼거렸다.
“이 바위는 주술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나는 이것을 열고 닫는 주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단 말야. 어디 한번 시험해 볼까?”
그리고 그는 바위를 향해 소리쳤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거대한 바위가 거짓말처럼 갈라지면서 활짝 열렸던 것이다. 알리바바는 겁이 나서 당장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나 겁이 나서 달아날 용기마저 생기지 않았다. 잠시 후에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그는 운명의 힘에 이끌리기라도 하듯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알리바바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둠과 공포의 동굴이 아니라 길게 뻗어 있는 넓은 복도였다. 규칙적인 간격으로 대리석 기둥이 서 있는 그 복도는 넓은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알리바바는 천장이 둥근 넓은 방까지 걸어갔다. 그가 거기까지 도착하자 둘로 갈라졌던 바위는 소리도 없이 다시 닫혀 입구를 막아버렸다.
그 방 안으로 들어선 알리바바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넓은 방에는 벽면을 따라 사방에 온갖 보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것이다. 갖가지 호사스러운 상품이며 비단들, 디나르 금화가 가득 찬 상자들, 금괴며 은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자들이 천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었다. 방바닥에는 또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은 세공품들이며, 갖가지 색깔의 보석들이 지천으로 흩어져 있었다. 알리바바는 태어난 뒤 지금까지 그런 값비싼 물건들은 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 모든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그 엄청난 보물들을 둘러보면서 알리바바는 이 동굴이야말로 누대에 걸친 도적들이 장물을 숨겨온 비밀 장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소리쳤다.
“알리바바야! 알라께 맹세코, 마침내 너의 운명도 열리게 되었다. 너는 마법의 주문으로 이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지하 동굴의 바위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오, 축복받은 나무꾼이여! 너는 몇 대에 걸쳐 도적들이 긁어모은 재보의 주인이 된 것이다.”
<글:하일지>
대정부질문 >
-

동아광장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동아경제 人터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2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3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4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5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6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7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노블레스 오블리주 표본”
-
2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3
야상 입은 이정현 “당보다 지지율 낮은데 또 나오려 해”…판갈이 공천 예고
-
4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5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6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무지개다리 건넜다…“언젠가 꼭 다시 만나”
-
7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국회대정부질문/韓美안보공조]『대북정책 원칙 세우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