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화문에서/허승호]인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
-
입력 2007년 11월 15일 03시 02분
글자크기 설정

송도는 국제비즈니스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산업도시로, 영종은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도시로, 청라는 레저 및 국제금융도시로 각각 조성된다. 이 중 송도 쪽의 사업 진척이 가장 빨라 국제업무단지, IT단지, BT단지, 주거시설 등이 착착 들어서고 있다.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12.3km의 인천대교가 건설되는 모습까지 보면 웬만한 사람은 감동을 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생각보다 꿈이 크다. 한국의 ‘기업도시’가 아니라 ‘동북아 허브’가 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한국의 생존 공간은 그리 넓지 않다. 특히 풍부한 잠재시장 및 값싼 노동력을 갖춘 중국과 ‘제조업 백병전’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다.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도쿄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위치, 수도권의 각종 기반시설, 풍부한 고급 인력 등을 활용해 동북아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첨단기술 및 제조 기반, 이를 뒷받침해 주는 고급 인력에서 중국에 앞선다는 강점을 지렛대로 해 부가가치 고지(高地)의 위쪽에 포진하는 전략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열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들고 해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인천 물류기지, 개성의 경공업, 해주의 정보기술 등으로 역할 분담의 삼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갈 길이 너무 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지금까지 31건 360억 달러의 외자가 들어왔다. 적잖은 액수다. 하지만 동북아 허브가 되려면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등과 경쟁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중 몇 곳을 유치했느냐를 따져 봐야 한다. 경쟁 도시들과 달리 인천에는 단 한 개의 100대 기업도 없다.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가장 큰 걸림돌로 균형발전정책의 무차별 적용을 지목했다. “현재 특구는 수도권 규제에 얽매여 있다. 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균형발전이냐 동북아 허브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민희경 자유구역청 투자본부장은 덧붙였다. “인천과 경쟁 도시는 IT, BT, 레저, 물류 등 발전전략이 비슷해 차별화가 쉽지 않다. 내가 주부(主婦)라서 잘 아는데 외국 기업이 오려면 무엇보다 외국인 주부가 살기 편해야 한다. 교육 의료뿐 아니라 쇼핑이 쉬워야 한다. 여기서 인천은 상하이에 뒤진다. 마트에 치즈도 제대로 없다.”
국책사업인지 지방사업인지 정체성도 모호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됐지만 특구청의 법적 지위는 인천시의 출장소다. 그러다 보니 송도 일대의 땅값이 오르자 인천시의회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맡고 있는 게일사 미국 본사에 ‘회장 소환장’을 보냈다. 아직 개발도 안 끝난 사업인데 “수익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투자하겠는가.
허승호 논설위원 tigera@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3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4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7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8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9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10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3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4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7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8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9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6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9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10
지선앞 ‘자폭 제명’… 한동훈 끝내 쳐냈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차승재의 영화이야기]'영화 아카데미'의 빛과 그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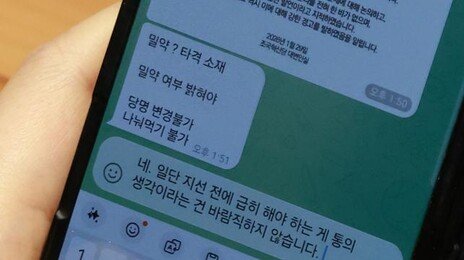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