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이정은]‘質보다 量’ 17대국회 1년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제출된 법안들을 심사하다 보면 가슴부터 답답해진다”며 이같이 푸념했다.
법치국가에서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막는다는 것이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걸 법률전문가인 그가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의 푸념은 법안 처리에 허덕이는 국회의 현 상황을 잘 보여 준다.
국회 관계자들은 17대 국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의원들이 낸 법안의 급증을 든다. 시민단체나 언론이 법안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또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지는 현상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의원회관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안 베끼기 경쟁 때문이다. 한 의원보좌관은 “옆방에서 우리 법안을 베끼지 못하도록 보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사건이 터진 뒤 ‘전파를 차단하자’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 제출됐다. 또 학교급식 파동 때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6건, 경남 밀양 성폭력사건 때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3건 나왔다. 문제는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국회 출석률도 중요해졌다. 의원들의 누적 출석시간을 체크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한 재선의원은 “아예 의원석에 센서를 달아서 계산하면 어떻겠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전문가들은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평가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定性) 평가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회의에서 얼마나 깊이 논의하는지, 법안 내용은 얼마나 튼실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대 국회 출범 1주년을 계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원들 스스로 “숫자로 대충 때우지 않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기자의 눈 >
-

특파원 칼럼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기고
구독
트렌드뉴스
-
1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2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
3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4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5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6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9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 100년 잠자던 ‘관세법 338조’ 꺼내드나
-
10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1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2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5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6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트렌드뉴스
-
1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가능한 적은 금액’ 즉시 인출하세요
-
2
손흥민, 메시와 첫 맞대결서 판정승…7만명 관중 기립박수
-
3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4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5
다리 멀쩡한데 “택시비 아끼려” 119 불러… 응급환자는 14%뿐
-
6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9
상호관세 막힌 트럼프, 100년 잠자던 ‘관세법 338조’ 꺼내드나
-
10
김민석 “黨, 대통령과 차별화해선 성공 불가능”
-
1
“장동혁 사퇴” “분열 행위”…‘尹 절연’ 거부에 원외당협 정면 충돌
-
2
韓 ‘프리덤 실드’ 축소 제안에 美 난색…DMZ 이어 한미동맹 갈등 노출
-
3
李 “다주택자 압박하면 전월세 불안? 기적의 논리”
-
4
야상 입은 이정현, ‘계엄 연상’ 지적에 “뻥도 그정도면 병”
-
5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6
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지원’ 동참하면 보복하겠다”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급매 나오는 강남, 현금부자 ‘줍줍’…대출 막힌 강북은 버티기
-
9
조승래 “8곳 단체장 ‘무능한 尹키즈’…6·3 선거서 퇴출할 것”
-
10
[천광암 칼럼]장동혁은 대체 왜 이럴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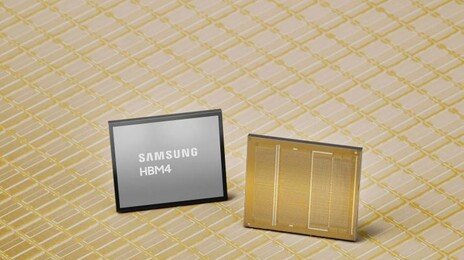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