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415>卷五.밀물과 썰물
-
입력 2005년 3월 25일 18시 33분
글자크기 설정

“모두 되도록이면 가벼운 차림으로 말위에 올라 대장군의 군막 앞으로 모이라!”
단잠에서 깨나자마자 그런 명을 받은 그들 2천은 곧 시키는 대로 따랐다. 모두 흉갑(胸甲)에 단병(短兵)만 갖추고 말위에 올라 한신의 군막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신이 그들에게 붉은 깃발을 하나씩 나눠주게 하고 말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지름길로 정형 골짜기를 빠져나가 조나라 군사들이 굳게 누벽(壘壁)을 쌓고 있는 본진(本陣) 쪽으로 가라. 가만히 부근 산속에 숨어들어 살피고 있으면, 내일 새벽 먼저 우리 군사 1만 명이 그리로 갈 것이다. 하지만 조군(趙軍)은 틀림없이 그들을 못 본 척 지나 보낼 것이니, 너희들도 또한 조용히 보고만 있으라. 그러다가 다시 대장군의 깃발을 앞세운 우리 중군이 밀려들면 조군은 비로소 전군(全軍)을 들어 함빡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적의 본진이 비기를 기다렸다가 불시에 적진으로 치고 들어라. 그리고 남은 적병을 쓸어버린 뒤에는 조나라의 깃발을 모조리 뽑아버리고, 우리 한나라의 붉은 깃발로 적진을 뒤덮어 버려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명이었으나, 그동안 한신이 거두어 둔 믿음이 있어 2천의 기마대는 말없이 그 명을 따랐다. 초겨울 삼경의 매서운 바람을 마다않고 밤길을 달려 먼저 정형 어귀를 나갔다. 이어 한신은 다시 군사 1만 명을 골라 뽑게 한 뒤 비장(裨將)들에게 가벼운 음식을 나눠주게 하면서 말했다.
“주먹밥 한 덩이에 물 한잔이라고 너무 서운해 하지 말라. 내일 아침 조나라 군사를 깨뜨린 뒤에 술과 고기로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주리라!”
하지만 음식을 나눠주는 장수들도 받아먹는 이졸들도 그와 같은 큰소리를 다 믿어주지는 않았다. 그들도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조나라 군사가 20만이 넘는다는 소문은 듣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쳐부술 수 없는 대군이라는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한신의 말을 믿는 척 건성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지요.”
한신이 그런 눈치를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었다.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빙긋이 웃으며 곁에 있는 군리(軍吏)에게 물었다.
“너도 내 말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 군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실은 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가는 우리 군사 1만 명은 적진 앞을 지나가도 적군이 그냥 보낼 것이라 하셨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또 그런 군사로 어떻게 적의 2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쳐부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반문에 한신이 마음먹고 기다린 듯 차근차근 까닭을 일러주었다.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사설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K-TECH 글로벌 리더스
구독
트렌드뉴스
-
1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2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3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4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5
대서양 동맹의 분열…이란 공격 찬반, 서방 주요국 확 갈렸다
-
6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쿠르드軍, 이란 진격
-
7
“빨리 비켜!” 구급차 막은 택시 운전석 텅~ 로보택시 ‘진땀’
-
8
[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
9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10
휠체어 탄 팬 보자마자 차에서 내렸다…김민재 따뜻한 팬서비스 화제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3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4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5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6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7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트렌드뉴스
-
1
美, 최신예 미사일 ‘프리즘’ 이란서 처음 쐈다…“추종 불허 전력”
-
2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3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4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5
대서양 동맹의 분열…이란 공격 찬반, 서방 주요국 확 갈렸다
-
6
트럼프의 ‘대리 지상전’… 쿠르드軍, 이란 진격
-
7
“빨리 비켜!” 구급차 막은 택시 운전석 텅~ 로보택시 ‘진땀’
-
8
[사설]“李에 돈 안 줘” 김성태 새 녹취… 사실 여부 철저히 밝혀야
-
9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10
휠체어 탄 팬 보자마자 차에서 내렸다…김민재 따뜻한 팬서비스 화제
-
1
[김순덕 칼럼]‘삼권장악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텐가
-
2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3
李 “주유소 휘발유 값 폭등…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해”
-
4
李 “‘다음은 北’ 이상한 소리하는 사람 있어…무슨 득 있나”
-
5
트럼프, 결국 ‘대리 지상전’…쿠르드 반군 “美요청에 이란 공격”
-
6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7
與 경남도지사 후보 김경수 단수 공천
-
8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9
[단독]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
10
국힘, 靑 앞서 의총…“李, 사법 악법 공포하면 역사 죄인될 것”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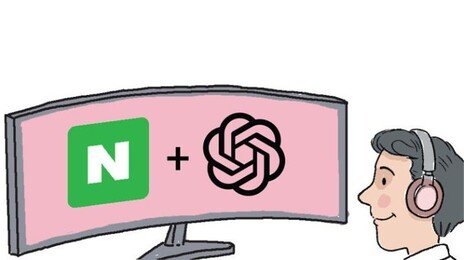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