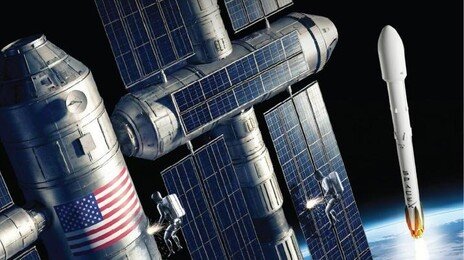공유하기
외국인 근로자 “아파도 참아요”…35만명중 70% 불법체류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8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말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견디지 못해 연수 중이던 업체를 이탈해 경기 성남시의 한 가구공장에 불법 취업한 것이 화근이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 발을 찧는 사고를 당했지만 의료보험이 안돼 비싼 치료비 걱정에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다.
그러기를 한 달, 다리 전체의 감각이 없어지고 상처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끝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출국 전 그는 “꿈에서라도 다시는 한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수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
6월 현재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는 35여만명. 이 중 60∼70%가 불법체류자인 탓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보험 적용 등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 찾기를 기피하는 바람에 작은 병을 크게 키우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
▽실태〓2년간 경기 의정부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근무한 몽골인 바트샌드(35)는 올 초 심한 복통을 느꼈지만 병원을 찾지 않고 진통제로 견디다 결국 혼수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급성맹장염이 악화돼 복막염으로 진행된 데다 패혈증까지 겹쳤던 것.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동포도 사정은 마찬가지. 1년 전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주고 밀입국한 조선족 강모씨(47)는 몇 달 전 병원에서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몸살과 현기증이 잦았지만 병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채 감기약으로 견디며 공사판을 전전하다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죽을 병인 줄 알거나 심각한 외상이 아니면 병원을 찾을 엄두조차 못내는 게 현실이다. 의료 혜택이 전무해 엄청나게 비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프거나 다쳐도 몇 알의 진통제로 병을 ‘키우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0월 서울의 한 구청 보건소가 외국인 근로자 351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벌인 결과 141명이 재검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폐결핵과 간질환, 당뇨병 등 심각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나 태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일부는 에이즈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받기보다는 추방이 두려워 아예 잠적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를 펴낸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 이왕준(李旺俊) 운영위원장은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는 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라며 “산업연수생도 정기검진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검진이 이뤄지는 업체는 드물다”고 말했다.
▽대책〓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제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의료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김해성(金海成)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 실태는 임금체불 다음으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 수혜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3
코스피만 뜨겁다…건설-생산 한파, 지갑도 꽁꽁 얼어붙어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6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7
워시 연준의장 지명에 금-은 폭락…안전자산 랠리 끝?
-
8
‘강남 결혼식’ 식대 평균 9만원 넘어…청첩장이 두렵다
-
9
“배달시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 엘레베이터 안내문에 시끌
-
10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3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9
김정관, 러트닉과 관세 결론 못 내…“향후 화상으로 대화”
-
10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3
코스피만 뜨겁다…건설-생산 한파, 지갑도 꽁꽁 얼어붙어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6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7
워시 연준의장 지명에 금-은 폭락…안전자산 랠리 끝?
-
8
‘강남 결혼식’ 식대 평균 9만원 넘어…청첩장이 두렵다
-
9
“배달시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 엘레베이터 안내문에 시끌
-
10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3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4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5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6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李 “부동산 정상화, 5천피-계곡 정비보다 쉬워”
-
9
김정관, 러트닉과 관세 결론 못 내…“향후 화상으로 대화”
-
10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