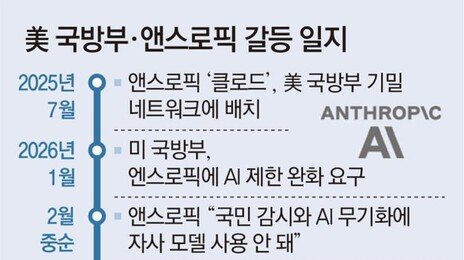공유하기
[소설]봉순이 언니(39)
-
입력 1998년 6월 11일 07시 41분
글자크기 설정
― 엄마, 차가와. 비가 오잖아.
어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 비가 떨어지고 있더라고, 기가 막힌 어머니가 철시한 아현시장 중간에 서서 어쩔까, 하고 있으려니 애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더라고, 그후로도 몇날 동안 그렇게 몇번을 자다가 까무러치고 그렇게 몇번을 자다가 몸부림을 치며 울고,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 나는 거짓말처럼 말짱했다. 사지를 뒤틀며 경기를 한 것도 어머니가 나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간 것도, 비가 온다고 엄마에게 말한 것도 거짓말처럼 기억나지 않았다.
사라진 봉순이언니는 사라짐으로써 자신이 다이아반지를 훔쳤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셈이었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언니나 오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 그녀의 배신에 대해 혀를 차고 있었다. 게다가 부끄럽게도 스물도 안된 처녀가 남자와, 그것도 평판이 안 좋은 남자와 도망을 치다니. 그녀는 배신자이며 도둑이며 화냥녀였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도, 그런 아이를 배곯을 때부터 데리고 키워준 것도 다 어머니가 사람이 착해서였다.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배신자이며 도둑인 사람을 그리워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요즘들어, 막내가 봉순이 등에 붙어 자라서 걱정했는데 신통하게도 잘 적응하고 있어서 그래도 한시름 덜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그림책에 얼굴을 박았다. 그때 말을 타고 지나가던 왕자님이 물었습니다. 이 공주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지요?
―몇살이냐?
어머니가 묻자 소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내리깔았고 그러자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쁜 계모가 우리 착한 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먹였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그녀의 입에 입을 맞추어 주기 전까지 공주는 깨어날 수 없답니다.
―니가 열셋이냐 열넷이냐…아무튼 우리 먼 친척인데, 지난번에 내가 고향 결혼식에 내려갔더니 얘 엄마가 얠 어디 취직 좀 시켜달라 하더라구. 공장에 보낼 수 없겠냐 그러길래, 그래, 내가 공장은 절대 안된다구 데리구 올라왔지. 요새 새루 생긴 구로공단인가에서 애들을 꼬실려구 혈안이 된 모냥이야. 근데 공장가믄 여자애들 다 버리잖아.
<글: 공지영>
총선 : 여론조사 >
-

오늘의 운세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월요 초대석
구독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3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4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5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6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7
끈끈하던 美-이란, 47년전 ‘대사관 444일 인질극’ 뒤 최악 앙숙
-
8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9
“갤S26 화면보호 기술 5년 걸려… 복제 쉽지 않을 것”
-
10
압류 코인 ‘비번’ 흘린 국세청… 하루만에 거액 유출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7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트렌드뉴스
-
1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2
CIA “28일 오전 수뇌회의, 하메네이 온다”… 해뜬뒤 이례적 공습
-
3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4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
5
美중부사령부 “링컨호 멀쩡히 작전 중…이란 미사일 근처도 못 왔다”
-
6
“절대 입에 안 댄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7
끈끈하던 美-이란, 47년전 ‘대사관 444일 인질극’ 뒤 최악 앙숙
-
8
“日 국민 대부분은 韓에 ‘과거사’ 사과 당연하다고 생각”
-
9
“갤S26 화면보호 기술 5년 걸려… 복제 쉽지 않을 것”
-
10
압류 코인 ‘비번’ 흘린 국세청… 하루만에 거액 유출
-
1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2
하메네이 딸-사위도 사망…美 ‘단 하루’ 공습에 36년 독재 끝났다
-
3
‘대법관 증원법’ 가결…李대통령이 26명 중 22명 임명한다
-
4
“하메네이 사망” 트럼프 공식 발표…“일주일간 폭격할 것”
-
5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6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7
전한길 토론 보더니… 장동혁 “부정선거 막을 시스템 재설계 필요”
-
8
‘총 쏘는 13세 김주애’ 단독샷 이례적 공개…또 가죽점퍼
-
9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여론조사/내년총선 지지정당]40代이상-한나라 30代-신당](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