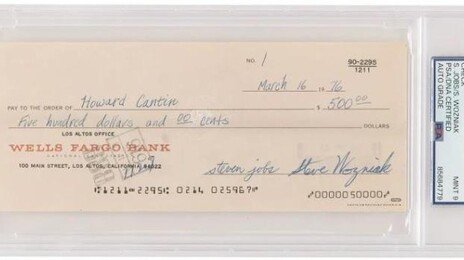공유하기
[KS다이어리] ‘말의 달인’ 이진영 공인 ‘SK대변인’
-
입력 2008년 10월 31일 09시 33분
글자크기 설정
SK로 범위를 국한시키면 이진영, 정근우 같은 선수들이 좋은 취재원의 마인드를 갖춘 모범 사례에 해당됩니다. 늘 유쾌하고, 질문 의도에 대한 이해도 빠르죠. 특히 이진영 같은 경우는 김성근 감독이 “SK 대변인”이라고 ‘우대’할 정돕니다. 주장 신분도 아닌데 미디어데이에 단골 출석하는 이유도 그래서죠. 이런 선수가 있으면 그 구단의 이미지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에 비해 김재현, 조웅천 등 베테랑은 평소엔 과묵하지만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실히 할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번 한국시리즈 들어 팀 후배들 사이에 “재현이 형이 일부러 오버하는 것 같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리더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요. 반면 극소수이긴 하지만 ‘나는 야구만 잘 하면 된다’는 주의의 선수도 없진 않습니다. 스포츠이자 비즈니스인 프로야구의 속성에 무지한 케이스죠.
또 팀마다 문화가 약간씩 다른데 젊은 선수들도 자기표현을 자유롭게 꺼내는 두산 같은 팀이 있는가 하면 위계질서가 엄격해 후배들이 선뜻 못 나서는 구단도 있습니다.
대체로 어느 팀이나 코치는 잘 나서지 않지만 SK 김성근 감독, 한화 김인식 감독처럼 거장이 몸담고 있는 구단은 이런 성향이 더 강합니다. SK 이만수 코치 기사를 읽기 힘든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이밖에 팀 분위기나 선수 개인 사정(FA를 앞두고 있다든지)에 따라 인터뷰 농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행간을 읽는 독자라면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실 |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관련기사] 이진영 “100번에 한번 꼴 명캐치…눈 감으면 돼”
[관련기사] ‘철완’ 조웅천 “다음엔 꼭 안타칠 거야”
트렌드뉴스
-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2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8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9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
10
다카이치, 팔 통증에 생방송 30분전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2
홍석천 “부동산에 속아 2억에 넘긴 재개발 앞둔 집, 현재 30억”
-
3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4
“놓지마!” 애원에도…술 취해 어린아들 7층 창문에 매단 아버지
-
5
“까치발 들고 물 1.5L 마시기”…50대 매끈한 다리 어떻게? [바디플랜]
-
6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7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8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9
김건희 “편지-영치금 큰 위안” vs 특검 “주가조작 전주이자 공범”
-
10
다카이치, 팔 통증에 생방송 30분전 취소…총선 앞 건강 변수 부상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8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9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