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심 논란에 가려진 스위스의 힘
-
입력 2006년 6월 24일 09시 02분
글자크기 설정
스위스는 첫 경기 프랑스 전부터 눈먼 주심(?)의 수혜를 입었다.
당시 프랑스 티에리 앙리가 문전 앞에서 찬 볼이 스위스의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의 손에 맞았지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다. 결국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만약 핸들링 반칙이 제대로 선언되었다면 스위스는 승점 1점조차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토고 전에서도 주심의 판정은 스위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전반전, 토고의 스트라이커 에마뉘엘 아데바요르가 패널티라인을 돌파해 단독 찬스를 맞았다. 다급해진 스위스 수비수는 아데바요르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으나 주심은 반칙을 주지 않았다. 명백하게 패널티킥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 역시 경기는 스위스의 2-0 승리였다. 토고가 당시 한 골을 만회했더라면 역시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스위스와 한국의 경기는 오심 논란의 절정이었다.
프라이의 두 번째 골이 오프사이드냐 아니냐는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스위스의 수비수 파트리크 뮐러가 전.후반 한 차례 씩 스위스 골문 앞에서 손으로 볼을 건드리는 장면이 느린 화면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주심은 패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다. 뮐러는 프랑스 전 이후 모두 3차례나 핸들링 반칙을 범하고도 무사히 넘어갔으니 과연 이번 대회 '신의 손'으로 불릴 만 하다.
스위스 출신의 제프 블레터 FIFA회장은 일부러 스위스 경기를 참관하지 않았을 정도로 편파 판정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심판들은 스위스에게 여러 차례 유리한 판정을 내리며 결과적으로 블레터 회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전력을 갖춘 스위스 대표팀으로서도 왠지 찝찝한 기분을 감추기 힘들 것 같다.
정진구 스포츠동아 기자 jingooj@donga.com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0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4
이광재 “우상호 돕겠다” 지선 불출마…禹 “어려운 결단 고마워”
-
5
비트코인, 9개월만에 7만 달러대로…연준 의장 워시 지명 영향
-
6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7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8
한준호, 정청래에 “조국혁신당 합당, 여기서 멈춰 달라”
-
9
“평생 취미 등산 덕분에 88세 성균관장 도전”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0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3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10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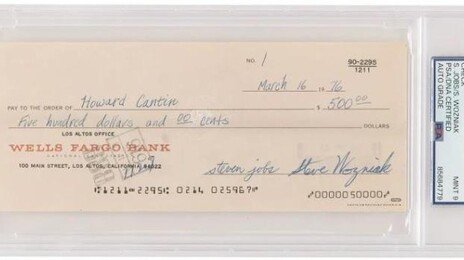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