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다고 퇴원 말렸는데…”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밀양 병원 화재 참사]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

“돈 보고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없다면서 악착같이 일하더니….”
간호를 천직으로 알던 아내였다. 간호조무사 김모 씨(37)의 남편은 26일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고는 망연자실했다. 이날 오전 7시 반경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을 덮친 화마(火魔)가 아내를 앗아갔다. 남편 김모 씨는 “아침에 아내가 전화를 했다. ‘살려줘. 병원인데 불이 크게 났어’라고만 말하고 끊겼다. 1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살려줘’라고 하더니 또 끊겼다”고 말했다. 김 씨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 “엄마, 어떡해” 전화만 남기고…
맏딸로서 집안의 기둥이었던 간호사 김모 씨(49)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72)를 모시고 살다가 변을 당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2015년 면허증을 따고 간호사가 됐다. 김 씨는 간호사가 된 이후 세종병원에서 일했다. 이날도 어머니가 건넨 주스를 마시고는 “너무 맛있다”며 너스레를 떨고 출근했다. 김 씨 어머니는 “7시 35분쯤 딸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 엄마, 어떡해, 어떡해’만 하더니 끊겼다. 연기를 얼마나 마셨는지 얼굴이며 콧구멍이 새까맣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더라”라며 가슴을 쳤다.
○ “춥다고 퇴원을 미뤘는데…” 망연자실
어머니 현모 씨(89)의 사고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달려온 김모 씨(63)는 전날까지만 해도 설 연휴를 함께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지난해 퇴직한 코레일에서 근무할 때 연휴는 언감생심이었다. 이제야 가족과 첫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3층 병실에 있던 어머니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평생 시골에서 고추와 깻잎 농사를 지으며 자신을 뒷바라지한 어머니였다. “며칠 전 어머니를 퇴원시키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워 노인에게 안 좋을까봐 미뤘다. 그게 천추의 한”이라며 비통해했다.
“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이모 씨(35)의 남편 문모 씨는 영정에 있는, 대학 시절 찍은 부인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이 씨는 교통사고로 왼쪽 정강이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뒤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부는 12세 아들만 바라보며 각각 식당일과 화물차 운전을 했다. 문 씨는 “형편은 변변치 않아도 항상 웃던 아내였다. 한쪽 발로 다녀야 해 제대로 피하지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손으로 긁어 문 열고 피신한 환자들도
겨우 목숨을 구한 환자도 있었다. 5층에서 가장 먼저 탈출한 김모 씨(89)는 병실 미닫이문을 손으로 박박 긁어서 열고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 마침 그를 발견한 소방대원이 업어서 구출했다. 김 씨는 “틀니고 시계고 지팡이고 다 두고 나왔다. 살아 있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얼굴을 찡그렸다. 203호 병실에 있던 양모 씨(66·여)는 “방에 남아 고래고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다. 숨진 사람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떨면서 말했다.
밀양=권기범 kaki@donga.com·정현우·유주은 기자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5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6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민관군 자문위 권고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르포]“노벨상 안줬다고 그린란드 달라는 트럼프를 어찌 믿나”
-
9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10
“12살에 축구회 조직…가난했던 월계동 소년들 뭉쳤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트렌드뉴스
-
1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로 연대 입학”…당시 그런 전형 없었다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4
[단독]“5000만원씩 두 상자…윤영호 ‘王자 노리개 상자’ 권성동에 건네”
-
5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쳤다…韓 1041조원 vs 日 1021조원
-
6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민관군 자문위 권고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르포]“노벨상 안줬다고 그린란드 달라는 트럼프를 어찌 믿나”
-
9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10
“12살에 축구회 조직…가난했던 월계동 소년들 뭉쳤죠”[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3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의식 혼미, 심정지 가능성”…단식 8일째 구급차 대기
-
6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9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10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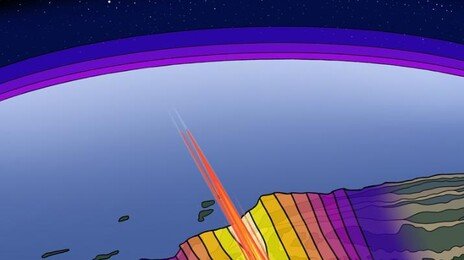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