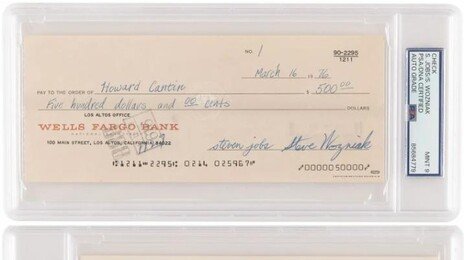공유하기
[오늘과 내일/심규선]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빚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글자크기 설정

서울교육은 종종 그렇게 불려왔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서울교육이 다른 시도의 모델이 되고, 새로운 교육제도도 서울에서 풍향을 봐야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교육은 한국교육의 미래이자, 테스트마켓인 것이다.
그렇게 ‘대단한’ 서울교육의 선장이 교육감이다. 그런 서울시교육감이 요즘 곤경에 빠져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7월 첫 직접선거에서 감독 대상인 학원과 사학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려 쓴 게 문제가 돼 수사를 받고 있다. 법 이전에 분명 잘못한 일이다.
직접선거의 가시에 찔린 서울 교육
최근 20여 년간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에서 간접선거를 거쳐 직접선거로 바뀌어 왔다. 민의가 많이 반영될수록 교육감의 대표성과 추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명분은 좋았으나 이는 깨끗한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직접선거가 임명제나 간접선거보다 오히려 치명적이라는 걸 공 교육감의 사례는 보여줬다.
선출방식과 관계없이 예전에도 교육감 자리를 둘러싼 잡음은 있어왔다. 독직사건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구속된 경우도 있었고, 코드 인사나 지역편중 인사로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독직사건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돼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무마됐고, 인사를 둘러싼 잡음도 권한 내의 일이어서 담장 밖까지는 시끄럽지 않았다. 공 교육감은 사정이 다르다. 권위와 신뢰를 잃은 채 레임덕 속에서 일을 해야 한다.
지난번 선거가 있기 꽤 오래전에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지인에게 물어봤다. 공 교육감도 다음 선거에 나오느냐고. 임기가 1년 10개월밖에 안 되는 선거인 데다, 나이도 적지 않아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말이었다. 그 지인은 말했다. “나온다. 공 교육감은 자신이 다음 선거에 안 나온다고 하면 레임덕이 와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레임덕을 막겠다며 출마한 선거가 오히려 그의 족쇄가 된 건 아이러니다. 공 교육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직만 유지할 수 있다면 표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1년 반은 남아 있는 셈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지난번 선거에서 학교 선택권제 완성, 모든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과학영재교육 강화, 교원능력평가제도 도입, 방과 후 학교 강화,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등 굵직한 공약만도 열 개 이상을 내놓았다. 그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욕심은 버리는 게 옳다. 다음 세 가지라도 똑 부러지게 해놓고 공직을 마무리했으면 싶다.
우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며칠 전 전교조 등과 맺은 2004년 단체협약의 일부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전교조 등이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하겠다고 통고했다. 강한 의지가 읽힌다. 이번 기회에 교육당국이 전교조에 질질 끌려 다니거나 눈치를 보는 비겁한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 이 일은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는 공 교육감만이 할 수 있다.
실적만이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다
반드시 국제중도 설립해야 한다. 국제중 설립 문제는 그저 중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다. 그릇된 좌파 교육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며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철학의 근간과도 직결된 문제다. 국제중 문제를 넘지 못하고 세계를 운운하는 것은 부질없다.
2010년 예정인 고교선택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고교선택제도 단순히 학교배정방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다. 제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도 기계적 형평의 그늘에 안주해온 학교와 학생들에게 정당한 경쟁의 원리를 가르치는 일이다. 제도 자체가 가장 큰 교육이다.
공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빚을 졌다. 뽑아준 것도 빚이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레임덕을 자초한 것은 더 큰 빚이다. 세 가지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내는 게 빚을 갚는 일이다. 행동과 실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심규선 편집국 부국장 ksshim@donga.com
씨네@메일 >
-

동아닷컴 신간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4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5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6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7
밤사이 수도권 최대 10㎝ 폭설…월요일 출근길 비상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9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10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4
인간은 구경만…AI끼리 주인 뒷담화 내뱉는 SNS ‘몰트북’ 등장
-
5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6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7
밤사이 수도권 최대 10㎝ 폭설…월요일 출근길 비상
-
8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9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10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7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8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9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10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