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호적없는 호국영령들 호적 만들길 없나요"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24분
글자크기 설정
세묵씨의 아버지는 1909년 9월 ‘민적법’에 따라 호적을 만들면서 세묵씨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제 하에서 남은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광복을 맞은 뒤 91년이 돼서야 세묵씨는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판석씨 등 유족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묵씨의 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호적을 만들려고 했지만 호적에 관한 예규집인 대법원의 ‘호적선례요지집’은 ‘이미 사망한 무적자는 취적(就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전사자인 송기호(宋基號)씨 유족도 마찬가지의 경우. 전쟁 전 월남한 송씨는 남한에서 ‘가호적’을 만들 사이도 없이 참전해 51년 전사했다. 뒤따라 월남한 송씨의 딸(60)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의붓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채 살아왔다. 98년에야 국방부에서 아버지의 ‘전사확인서’를 받은 딸은 아버지의 호적을 만들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역시 같은 법적 문제에 부닥치게 됐다.
다행히 두 유족은 98년 전주지법과 서울가정법원에서 숙부와 아버지의 호적을 만들 수 있었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법원이 예규와 관계없이 취적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오랜 법원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두 유족을 자문했던 행정사 김상곤(金相坤·69)씨는 99년부터 ‘호적 없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취적 특례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두 유족과 같은 경우 국가에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즉시 유족이 죽은 사람의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
김씨는 올 3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특별법 제정을 탄원했고 법무부는 5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상태다. 김씨는 “최근 실향민의 호적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공자와 유족의 호적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육군이 진행중인 6·25 전사자 유해발굴이 성과를 거두면 곧바로 전몰군인의 취적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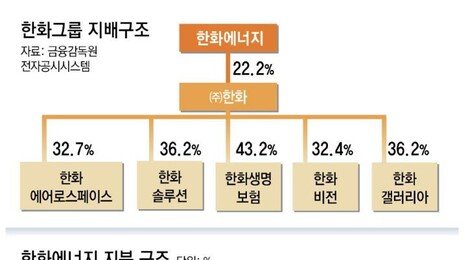
![부동산 정책 효과 안갯속인데 공무원에 파격 성과급[금융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2981448.1.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