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김창원]日 이지메 대처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얼마 전 대구의 한 남자 중학생이 급우들의 폭행과 집단따돌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에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 일본의 웹사이트를 검색해봤다. 일본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지메(집단따돌림의 일본어)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최근 일본에서 이지메 관련 보도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이지메 근절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서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뒤지면서 기자는 눈을 의심했다. 지난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이지메 등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지메 발생 건수가 무려 7만5000건이었다. 한 해 전보다 2000건이나 늘었다.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자살 건수도 2006년 이후 해마다 100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일본 교육당국은 이지메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 일본 교육전문가들은 자살 학생의 절반은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메 사건을 취재한 경험이 있는 한 일본 기자는 “지방에서는 이지메 문제를 빼면 취재할 게 없을 정도”라고 했다. “관련 보도가 줄어든 것은 이제는 만성화된 문제여서 뉴스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메가 일본에서 사회문제화한 것이 1986년 무렵이니 25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이지메 당하는 아이는 못난 아이,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로 여기는 사회문화도 한몫했다. 이지메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문제를 더욱 숨기게 만들어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96년 중학생 아들을 이지메 폭력으로 잃은 뒤 이지메 피해자를 위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오사와 히데아키(大澤秀明)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지메를 또래집단의 가벼운 장난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지메는 단호하게 벌을 받아야 할 죄임에도 가벼운 지도 정도로 그치는 관행이 이지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지메 근절에 실패한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하다. 집단따돌림은 심각한 범죄다.
김창원 도쿄 특파원 changkim@donga.com
기자의 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
구독
-

사설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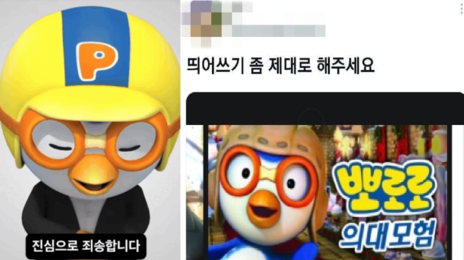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