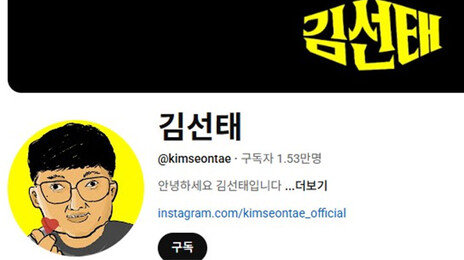공유하기
[20세기 우연과 필연]페니실린 탄생
-
입력 1999년 6월 30일 21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1928년 9월3일. 6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런던 패딩턴의 세인트 매리 병원 앨름로스 연구소로 돌아온 알렉산더 플레밍박사는 탄성을 내질렀다. 연구실 책상위에 수북이 쌓아뒀던 수많은 포도상구균 배양접시 중 한 곳에서 균이 죽어있는 것 아닌가.
당장 점검에 들어간 플레밍은 세균들이 주변의 푸른곰팡이 때문에 배양되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페니실륨 속(屬)에 속한 이 곰팡이가 만들어낸 물질, 즉 ‘페니실린’은 이렇게 탄생됐고 그후 수십억 인류의 생명을 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다.
플레밍 박사는 한마디로 행운아였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과학자 중 그만큼 우연과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물은 없었다.
페니실린 발견부터 그렇다. 처음부터 항생물질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미생물학자로서 포도상구균을 배양, 관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플레밍의 연구실(3층) 아래층에는 알레르기 천식을 유발하는 박테리아 연구실이 있었다. 2층에서 배양하던 푸른곰팡이 하나가 바람을 타고 3층 플레밍의 연구실 열린 창문을 통해 포도상구균 배양접시에 안착했으니 플레밍에겐 행운이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한 뒤 “수천가지의 곰팡이가 있고 수천가지의 세균이 있는데 마침 알맞은 시간, 알맞은 장소에 그 곰팡이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플레밍의 두번째 행운은 페니실린을 발견하기 6년전인 1922년에 있었다. 이때의 행운의 소재는 지독한 감기에 걸렸던 플레밍 자신의 콧물. 어느날 황색 세균으로 가득찬 배양접시를 만지작거리던 플레밍은 콧물 한방울을 배양접시 위에 떨구고 만다. 그런데 배양접시 속에서 처음보는 현상이 나타났다. 콧물이 떨어진 부분만 깨끗하게 세균이 정리됐던 것. 플레밍은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이 콧물이나 눈물 등 인체에 포함된 항생효소 리소자임 임을 발견한다. 리소자임 발견 경험은 후일 플레밍이 푸른곰팡이가 떨어진 배양접시를 무심코 넘길 수 없었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플레밍은 병리학자나 생화학자가 아닌 미생물학자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실험을 통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페니실린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거기까지 성공하지는 못했다. 결국 1929년 더 이상 탐구를 멈추고 그 결과만 논문으로 발표한다.
페니실린을 치료약으로 살려놓은 인물은 플레밍의 발견 10년 후에 활동했던 옥스퍼드대의 병리학자 하워드 플로리와 생화학자 에른스트 체인박사였다. 플레밍의 논문에서 영감을 얻은 두 사람 덕택으로 플레밍 본인까지 1945년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다. 그는 이후 모두 44개의 작위를 받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페니실린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여생을 행복하게 마쳤다.
페니실린은 2차세계대전중 부상자들에게 투여돼 수많은 목숨을 살렸다. 페니실린 발견 전 큰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30%에 불과했으나 페니실린을 쓴 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올라갔다. ‘마법의 탄환’ ‘기적의 약’이란 별명은 거저 붙은 것이 아니었다.
‘행운과 우연의 모자이크’라는 주위의 빈정거림에 대해 플레밍 박사는 뭐라고 응수했을까.
“나는 페니실린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만들었죠. 난 단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내가 단 하나 남보다 나았던 점은 그 관찰을 흘려보내지 않고 세균학자로서 대상을 추적한데 있습니다.”
〈런던〓윤영찬기자〉yyc11@donga.com
트렌드뉴스
-
1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충주맨’ 김선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청와대行 아니었다
-
4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용서 구한다”
-
5
“개학 늦춰주세요” 李대통령 틱톡 몰려간 학생들
-
6
李 분당자택 매수 희망자 나타나…靑 “완전히 팔린 건 아냐”
-
7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8
“소방관인데 소화기 사세요”…숙박업소-공장 등 노린 사기 기승
-
9
“무속인 지시 따르면 자녀 치료”…성적 영상 찍게하고 87억 뜯어
-
10
86세 전원주 “춤추다 낙상해 고관절 골절…다 고친뒤 나오겠다”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트렌드뉴스
-
1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2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3
‘충주맨’ 김선태,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청와대行 아니었다
-
4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용서 구한다”
-
5
“개학 늦춰주세요” 李대통령 틱톡 몰려간 학생들
-
6
李 분당자택 매수 희망자 나타나…靑 “완전히 팔린 건 아냐”
-
7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8
“소방관인데 소화기 사세요”…숙박업소-공장 등 노린 사기 기승
-
9
“무속인 지시 따르면 자녀 치료”…성적 영상 찍게하고 87억 뜯어
-
10
86세 전원주 “춤추다 낙상해 고관절 골절…다 고친뒤 나오겠다”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