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프로야구, 애물단지서 PR보배로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프로야구는 국내 대기업들의 치열한 각축장이다. 재계 순위 1위부터 5위까지인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와 12위 두산, 13위 한화가 각각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총 8개 구단 중 넥센을 제외한 이들 7개 구단 모(母)그룹의 자산총액을 합치면 무려 581조 원.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프로야구에서 ‘또 다른 승부’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 기업이미지 높이는데 효과 커
사실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에 대기업이 참여한 것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였다. 여기에 경기 수도 많고 구단 규모도 큰 탓에 각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했다. 한 수도권 구단 관계자는 “언론을 통한 홍보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야구단에 들어가는 액수에 비해 기업이 체감하는 이득은 적어서 예전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연히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 두산그룹은 야구팬 사이에서 ‘뚝심의 곰’으로 불리는 두산 베어스를 운영하며 그룹 이미지에도 큰 덕을 봤다. 두산 관계자는 “야구단에서 무명 선수를 꾸준히 믿고 지원해 ‘깜짝 스타’로 키우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재 중시’라는 그룹의 철학도 더 빛이 났다”고 설명했다. 럭키금성에서 LG로, 한국화약에서 한화로 그룹명을 변경한 두 그룹 역시 야구단의 우승을 통해 바뀐 그룹명을 알리는 효과를 봤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지난해 하위권에 머문 한 구단 더그아웃의 배경은 그룹의 주력회사인 A사 로고였다. A사 관계자는 “구단에 연락해 우리 로고 좀 빼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라며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고, 만날 감독과 선수들이 힘 빠지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을 배경으로 로고가 잡히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 재계 2, 3세들의 야구사랑
이처럼 프로야구는 오너의 개인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야구장 특별석을 마다하고 일반석에서 응원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히면서 ‘소탈하다’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
한편 오너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이 큰 것은 야구와 기업 경영이 서로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야구광으로 알려진 박용만 두산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은 종종 기업 경영을 야구에 빗대 설명한다. 리더십을 이야기하며 “야구팀의 코치같이 어느 정도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큰 목소리로 이끌지 않고 가르치고 키우고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박 회장)라고 설명하거나, 기업 경영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야구도 경영도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구 부회장)고 말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야구팀이 우승하려면 감독, 코치, 선수 등 수십 명이 합심해야 하고 부상, 연패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기업의 성공도 마찬가지”라며 “팀을 총괄하는 감독의 역할과 기업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비슷한 것처럼 기업이 야구에서 벤치마킹할 부분은 많다”고 설명했다.
트렌드뉴스
-
1
美, 이란전쟁에 하루 1조3000억원 쓴다…전투기 뜨면 443억
-
2
“맨홀에 끼여 발목 뼈 산산조각” 엄지원, 日 여행중 긴급수술
-
3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4
‘충주맨’ 김선태, 영상 하나로 이틀만에 100만 구독자
-
5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6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불법전단지 대량살포한 총책 구속
-
7
[속보]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확정”
-
8
한동훈 “장동혁, 이젠 법원을 제명할건가? 무능-무책임”
-
9
‘월 400만 원’ 인증한 태국인 노동자…“단 하루도 안쉬었다” [e글e글]
-
10
‘빅마마’ 이혜정 “부친은 유한킴벌리 초대 회장”…장항준 ‘깜짝’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3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4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5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6
민주 46% 국힘 21%…지지율 격차 더블스코어 이상 벌어졌다
-
7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대가 곧 알게될 것”
-
8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9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10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트렌드뉴스
-
1
美, 이란전쟁에 하루 1조3000억원 쓴다…전투기 뜨면 443억
-
2
“맨홀에 끼여 발목 뼈 산산조각” 엄지원, 日 여행중 긴급수술
-
3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4
‘충주맨’ 김선태, 영상 하나로 이틀만에 100만 구독자
-
5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6
강남역 일대서 ‘셔츠룸’ 불법전단지 대량살포한 총책 구속
-
7
[속보]강훈식 “UAE서 600만 배럴 이상 원유 긴급 도입 확정”
-
8
한동훈 “장동혁, 이젠 법원을 제명할건가? 무능-무책임”
-
9
‘월 400만 원’ 인증한 태국인 노동자…“단 하루도 안쉬었다” [e글e글]
-
10
‘빅마마’ 이혜정 “부친은 유한킴벌리 초대 회장”…장항준 ‘깜짝’
-
1
배현진 징계 효력 중지…“장동혁 지금이라도 반성하라”
-
2
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하게 바꾼다… 부정선거 의혹 차단
-
3
[단독]주한미군 패트리엇 ‘오산기지’ 이동… 수송기도 배치
-
4
법원, 장동혁 지도부의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
5
정청래 “‘대북송금’ 조작 검사들 감방 보내겠다…檢 날강도짓”
-
6
민주 46% 국힘 21%…지지율 격차 더블스코어 이상 벌어졌다
-
7
李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대가 곧 알게될 것”
-
8
“우리 아들-딸 왜 죽어야하나” 항의…팔 부러진채 끌려나갔다
-
9
울릉도 갔던 박단, 경북대병원 응급실 출근… “애써보겠다”
-
10
김어준에 발끈한 총리실…“중동 대책회의 없다고? 매일 챙겼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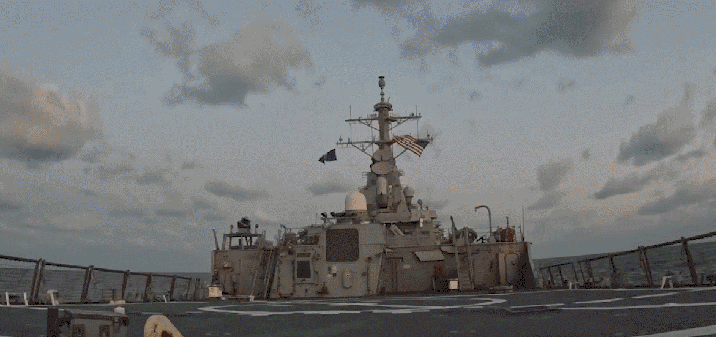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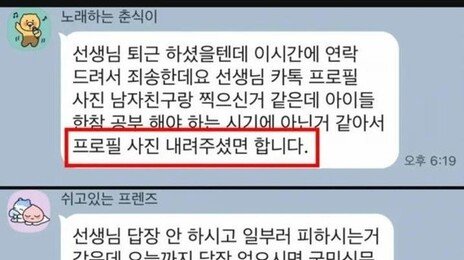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