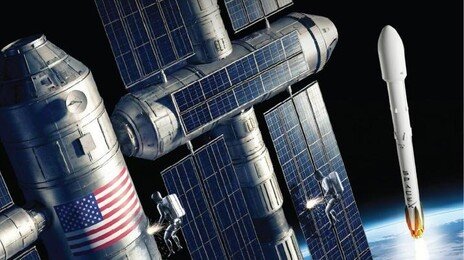공유하기
최정호교수, 60년전 일본인 은사와의 아름다운 재회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월드컵 한일 공동주최의 해 스승의날(5월15일)을 맞아 최정호 울산대 석좌교수가 최근 초등학교(국민학교)시절 일본인 은사를 찾아가 만난 뒤 그와의 인연을 회고하는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다.》
고희의 나이에 60년전의 옛 은사와 재회한다는 것은 자못 흥분스런 체험이다. 초등학교때의 담임이었던 일본인 교사를 나는 지난 달 말 큐슈 후쿠오카(福岡)의 사저로 찾아가 만났다. 올해 만 84세가 되는 무라마쓰 스케오(村松祐男)선생.
그는 어떤 교사였는가.
아무리 공치사를 한다 해도 자애로운 교사는 아니었다. 그는 엄하고 사나운 선생이었다. 우리 모두가 그를 무서워했다. ‘싸난뱅이 선생’ 이 그의 별명이었다.
일제 치하의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2학년이 되자 무라마쓰 선생이 우리 담임교사가 되었다. 과연 소문대로의 무서운 선생이었다. 특히 그가 노상 들고 다니는 기름이 매끈한 대나무뿌리 매. 지각을 했다면 한 대! 수업시간에 졸았다면 한 대! 숙제를 안해왔다면 한 대!…. 이렇게 어린 아이 머리가 그때마다 대나무뿌리 매로 얻어맞고 나면 더러는 만화의 그림처럼 머리가 여기저기 울퉁불퉁 불거져나와 하교할 때엔 모자가 안들어가는 머리통도 있었다.
|
그런 매를 맞고도 아파서는 울어도 분하다거나 억울하다고 우는 아이는 없었다. 싸난뱅이 선생의 매는 공정했고 언제나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무서워하기는 했으나 미워하지는 않았다. 더욱이 그를 존경하기조차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인으로선 보기드문 6척 장신의 총각. 키가 커서 ‘전봇대’란 별명도 붙은 그가 학교에 출퇴근하는 왕복 한시간 남짓한 길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년내내 책을 읽으며 걷는 모습은 우리 고장의 명물풍경이었다. 전봇대처럼 키큰 선생이 책만 들여다보고 걷는데도 진짜 전봇대에 한번도 부딪치지 않은 것은 신기하다고 우리들은 수근대기도 했다.
그는 문자 그대로 독서광이고 도서광이었다. 2평짜리 다다미방 두칸에서 장가들때까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선생댁에 한번 찾아가 보았더니 책장에서 넘쳐흐른 책들이 다다미방 모퉁이마다 ‘전봇대 선생’처럼 키가 자라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의 교육은 스파르타식이었다. 아이들에게 자기능력과 인내의 극한에 도전하도록 강요하는 학습과 훈련으로 우리들을 달달 볶았다.
가령 여름방학-. 그것은 마침내 모든 것에서 풀려났다는 해방감과 함께 하루도 마음놓고 놀아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숙제의 중압감이 교차하는 하나의 악몽이었다. 날마다 일기를 써라! 2학기때 배울 국어(일본어) 교과서를 미리 끝까지 읽고 외우라! 작문을 세편 쓰고 그림을 석장 그려 내라! 곤충 10점 식물 10점 이상 채집해서 표본을 만들어라! 글라이더(활공기) 모형을 제작해오라!….
그러나 일곱 살짜리 어린 아이가 모처럼의 방학에 어찌 뛰어놀지 않고 숙제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 여름을 실컷 놀다보니 금세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방학의 마지막 한주일은 ‘지옥’이 되었다.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령’이 내린 듯 산으로 들로 문방구 가게로 뛰어나가서 싸난뱅이 선생한테 야단맞지 않도록 내 숙제를 챙기기에 허둥댔다. 방학 마지막 이틀은 한달 일기를 이틀동안에 모아적느라 꼬박 밤을 새우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과제물을 한 짐 안고 잠을 설쳐 넋나간 몰골로 학교에 비틀비틀 등교했더니 숙제를 다 해온 아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대나무뿌리 매는 모두다 방면되는 ‘특사’가 이뤄졌다. 고지식하게 숙제를 다 챙겨온 아이만 억울한 꼴이 된 셈이다.
초등학교 6학년때 해방이 됐다. 1945년 8월 16일이던가 17일이던가…. 싸난뱅이 선생이 아이들 앞에 나타났다. “그동안 거짓말만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한 마디 내뱉은 선생은 아이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이들도 같이 울었다.
|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난 1970년대초 우리들은 무라마쓰 선생을 서울에서 다시 뵐 기회가 한 번 있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이 있지만 성공도 성적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건 입증하고 실감케한 기회였다.
싸난뱅이 선생에게 시험만 치렀다면 전부 빵점을 맞는다해서 ‘전빵’이란 애칭을 지닌 동문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오자 기중 먼저 큰 돈을 벌게 됐다. 그가 그동안 일본에 건너갈 때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더니 마침내 무라마쓰 선생을 ‘발굴’해서 내외분을 서울로 모셔온 것이다. 싸난뱅이 선생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워 한 데엔 공부를 잘 했고 못했고의 구별이 없었던 것이다.
거의 30년만에 뵌 왕년의 문학청년 선생은 이미 60이 가까운 노교사였다. 그가 스스로 털어놓은 그 사이의 변화는 세가지. 1945년 패전의 충격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귀국후 대학에 입학해 철학과 문학을 전공했다는 것, 그 결과 평생 그 자리를 지키려던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박탈’당하고 할 수 없이 중등학교 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선생의 머리는 30년전의 일제 시대때처럼 여전히 까까중 머리였다. 까닭을 물으니 얼마전 한 제자가 책방에서 책을 훔치다 잡혀왔기에 그를 훈계하기 위해서 삭발했다는 것이다. 역시 싸난뱅이 선생이었다.
10여명의 옛 제자들을 모아 성대하게 선생의 환영연을 베푼 ‘전빵’ 동문은 선생 내외분을 여기저기 변화한 한국의 모습을 구경시키고 나서 다시 서울로 모시고 와서 며칠 쉬게 해드렸다.
나는 그때 선생을 한번쯤 더 찾아 뵙고도 싶었으나 마음의 갈등이 있어 자제했다. ‘일본의 과거’를 아직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않고 있었던 당시의 나는 그 ‘과거’의 일부분인 일제 시대의 선생님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달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이 어둡고 괴로운, 불행한 세월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섧다해도 웬만한 봄은 아니어’(김소월) 우리들 어린 시절의 봄 역시 봄은 아름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처럼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봄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빼앗긴 들’에서의 봄이었다. 그렇기에 철이 든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김살없는 마음으로 구가하고 마냥 그리워할 수만은 없는 봄이었던 것이다.
나치스 독일군에 점령당했던 파리를 회상하면서 당시 프랑스인들은 점차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림으로써 ‘인격의 상실’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사르트르는 적은 일이 있다. 일제시대를 산 한국인도 마찬가지였으나 해방과 더불어 ‘미래’는 되찾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본교육을 받고 ‘사이비 일본인’으로 형성되다말고 해방을 맞은 우리 세대들은 8·15에 의해서 ‘과거’와 단절이 되고 ‘과거’를 상실하고 말아버렸다. 모든 인생에 있어 티없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야할 어린 시절을 빼앗겨버린 삶이 어찌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인격의 상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무라마쓰 선생은 그러한 나의 잃어버린 과거 속에 우뚝 서있는, 빼앗긴 들에서의 봄의 동상이었다. 30년전에 마치 ‘과거가 현재하듯’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맞을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30년-.
이번엔 내가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만났다. 그 사이 무엇이 다시 달라진 것일까. 내가 어느 덧 일제 35년의 두 배가 되는 세월을 살게 됨으로써 식민지 치하 12년의 다섯 배나 되는 연대를 광복한 조국에서 살아왔다는 마음의 안정이 있다.
일본과 일본인을 보는 내 눈도 달라졌다. 일제시대에 배운 것과는 ‘다른 일본’ ‘다른 일본인’이 있다는 것도 그 뒤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유일한 ‘남’, 절대적인 타자(他者)가 아니라 수 많은 남들 가운데의 하나의 남, 그 점에선 상대적인 타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60년의 세월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께름칙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옛 스승과의 재회를 구김살 없이 반길 수 있는 만남이 되게 해준 것이다.
옛날 삭발했던 선생의 머리에선 긴 백발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6척의 장신은 패스메이커(심장박동기)를 달고 방에서도 단장을 짚어야 하는 휜 허리 때문에 반 척은 줄어들었으나 시력과 청력은 여전했다. 그래서 정년퇴직 후 여태까지 20여년 동안이나 교사들과 주부들을 모아 한 달에 세 번씩 때로는 공회당에서 때로는 자택에서 고전문학의 독서회를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30평 대지에 지은 2층 가옥은 거실을 빼놓고는 방마다 레일을 달아 밀어붙일 수 있는 수많은 서가에 책이 넘치고 있었다. 정원 모퉁이에 창고가 두 칸 있으나 그곳도 책만으로 가득 채운 서고였다. 늙을 줄 모르는 독서광·도서광이라고나 할 것인지…. 스스로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모범을 보이는 자세를 60년 내내 견지해오고 있는 은사가 나는 자랑스러웠다.
환담 중에 선생은 말끝마다 한국을 생각하면 뒤가 켕기고 께름칙하다고 미안해하였다. 그러나 나는 8·15 해방직후 나이 어린 제자들 앞에서 싸난뱅이 선생이 흘린 눈물을 아직까지 내가 체험한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본인의 유일한 사과로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3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4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7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8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9
‘텍스트 힙’ 넘어 ‘라이팅 힙’으로… 종이와 책 집어드는 2030
-
10
‘강남 결혼식’ 식대 평균 9만원 넘어…청첩장이 두렵다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트렌드뉴스
-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
2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3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4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5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6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7
소니 집어삼킨 TCL, 다음 목표는 삼성-LG… 중국의 ‘TV 굴기’
-
8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9
‘텍스트 힙’ 넘어 ‘라이팅 힙’으로… 종이와 책 집어드는 2030
-
10
‘강남 결혼식’ 식대 평균 9만원 넘어…청첩장이 두렵다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8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9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10
코스피 불장에도 실물경기 꽁꽁… ‘일자리 저수지’ 건설업 바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