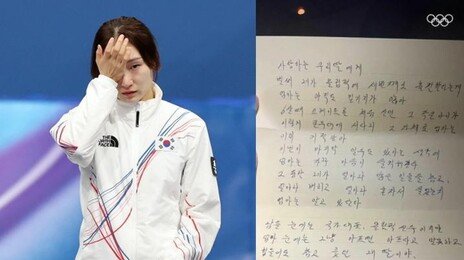공유하기
「인스턴트 사회」… 소설 설자리 없다
-
입력 1997년 10월 28일 08시 16분
글자크기 설정
최근 베스트셀러 시장에서 소설의 위상은 마치, 「풍금이 있던 자리」만큼이나 쓸쓸하다. 소설이 밀려난 자리엔, 비소설로 분류된 책들만 수북이 쌓여 있다.
종합순위 10위권에 이외수의 「황금비늘」(동문선)만이 외롭게 고개를 내밀고 있다.
왜일까. 많은 이들이 시절을 탓한다.
세기말, 시계의 태엽마저도 가쁜 숨을 토해내는 지금, 그저 가만히 머물러, 「마음이 움직이는 속도」에 귀를 기울이라고 속삭이는 소설의 문법은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무협소설보다 더 치열한 정치현실이, 온세상을 매스 히스테리로 몰아가는 월드컵 축구가 나날을 들뜨게 한다.
우리 존재의 틈새에 고이는 알 수 없는 슬픔, 그 비밀스러운 허전함, 시간에 볼모잡힌 생(生)의 좌절….
소설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있어, 한가로이 이를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인가.
「속도」에 감염된 현대인들이 정보와 교양을 찾고, 속도에 「치인」 현대인들이 한모금의 감동과 위안에 목말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제, 문학전집이 아닌 「한권으로 읽는∼」 시리즈에, 격조높은 픽션이나 소설보다는 「∼가지 이야기」에 눈을 돌린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이레)를 비롯한 잔잔한 읽을거리에 대한 호응이 그 증빙이다.
이제 감동과 위안마저도 속도전이다. 「내 밖」의 것들로 자신을 꽉 채워버린 현대인들. 스스로를 돌볼 겨를이 없다.
문학이라는 당의정(糖衣錠)은 거추장스럽다.
그 뜸들임, 그 기다림, 그 비켜섬이라니….
사실, 우리 시대 「101가지 이야기」의 성공은 소설의 「실패」와 맞물리고 있다.
30개 언어로 번역돼 1백50개국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이 「비소설」의 매력은 뭘까.
휴머니즘이 깃들인 에피소드의 정련(精鍊), 치밀하게 계산된 문장의 호흡, 영적인 울림이 있는 생활 속의 메시지 등등. 쉽고 재미있고, 충분히 감동적이라는 면에서 다분히 「할리우드적」이다.
여세를 겨냥하고 펴낸 「여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101가지 이야기」(이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1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샘물」을 길어올리는 「행복의 발견」(황금가지)도 소리없이, 소설의 빈자리를 메워나가고 있다. 「과연, 나 자신을 상냥하게 대했던 적이 언제였던가」라는, 평범함 속에서 삶의 신비와 빛을 읽어내는 저자 사라 브론넉의 일기체 고백이 독자들을 흔든다.
소설은 어떤가.
언뜻 눈에 띄는 테마 소설집 두권. 요즘 「좀 나간다」는 20, 30대 작가들이 죽음과 사랑을 주제로 쓴 신작 등을 모았다. 「꿈꾸는 죽음」(문학동네)과 「꽃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르네상스).
이들은 20대에, 인생을 채 시작하기도 전에 죽음을 말하고, 30대에 이미 세상을 다 살아버린 것처럼 정열과 사랑의 허망한 그림자를 좇는다.
새내기 작가들의 소설에서 느껴지는, 뭔가 「너무 이르게」 소진되는 것 같은, 피기도 전에 「잦아드는」 조로함이 출판시장에서도 문학의 생기를 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기우기자〉
트렌드뉴스
-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6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트렌드뉴스
-
1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신격호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별세…향년 85세
-
6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7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8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9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8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9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10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