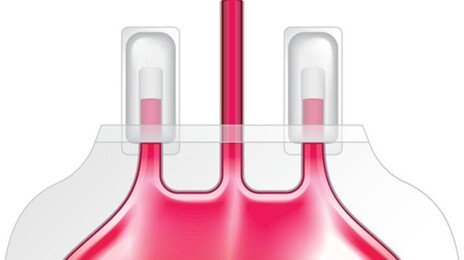공유하기
영화에 빠진 영상세대 「시네마키드」,시사회 단골손님
-
입력 1997년 5월 23일 07시 52분
글자크기 설정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현 칼럼]李 국정에 의문 생긴다면 ‘질책’ 아닌 ‘자문’해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2/132981050.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