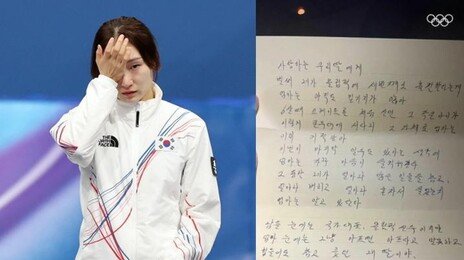공유하기
[문학예술]폭력에 찢긴 아프간인의 절규 '흙과 재'
-
입력 2002년 2월 1일 17시 46분
글자크기 설정

나치의 마수를 빠져나온 유태인과 자유주의자에서부터 소련군 탱크 아래의 체코를 등진 밀란 쿤데라까지, ‘망명문학’의 범위는 세계에 산재한 정치적 박해의 이력 만큼이나 넓고 풍성하다. 그러나 이 작가의 이력을 보면 다시 한번 찬찬히 책을 들여다보아야만 할 지도 모른다.
아티크 라히미. 1962년생. 소련군의 만행을 피해 1984년 조국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프랑스에 정착했다. 데뷔작인 이 중편소설을 포함해 갓 두 권의 소설을 썼을 뿐이다. 그러나 2001년 9월 이후 그의 이름은 전혀 새로운 울림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어권의 모든 주요 미디어가 그의 두 작품 위에 새로운 조명을 던지기 시작했다.
2인칭으로 불리는 주인공 ‘너’의 자리에 한 노인이 있다. 그는 손자를 데리고 건널목에 나와 언제 올 지도 모르는 차를 기다린다. 모든 것이 뿌연 재의 먼지속에 덮여있을 뿐, 평범한 일상과도 같은 풍경이다. 그러나 고요하고 희뿌연 풍경속에서, 노인의 회상 속에서, 대화 속에서, 경악과도 같은 잔인한 사실들이 드러난다.
 |
노인은 탄광으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거다. 아들은 아내에게 눈독을 들인 이웃을 삽으로 강타했다가 탄광으로 도피해있다. 노인과 동행한 손자는 노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곧 며칠 전 소련군의 폭격으로 아이의 귀가 먹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노인은 자신과 손주를 제외한 전 가족이 몰살당한 사실을 전하러 온 거다….
아프간 고유의 다리어(語)로 쓰여진 텍스트는 프랑스어로, 다시 한국어로 건너와 재조립 된 뒤에도 탁탁 끊어지는 듯 건조하면서도 신비한 울림을 전달한다.
“때때로 고통은 녹아내려서, 눈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되어 입으로 새어 나오기도 하죠. 우리 안에서 폭탄으로 변해 순식간에 우리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권력이 인간의 신앙이 되었지요. 이제 인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존엄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가게 주인 미르차 카디르는 전통적인 아프간 현자의 모습을 띤 채 때로 작가 내면의 절규를 그대로 옮긴다. 청력을 잃은 아이의 외침 역시 폭력으로 영성(靈性)까지 빼앗긴 한 사회의 비탄을 그대로 담아낸다. “할아버지, 소련 군인들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빼앗으러 온 거지? 목소리를 모아다가 뭘 하려고 그런 거야?”
노인의 아들은 ‘산처럼 대담무쌍하고 대지처럼 당당하며, 털끝만큼만 명예를 훼손당해도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자’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아프간인으로 그려지는 그의 자존심은 왜 이 땅이 끝없는 보복의 땅으로 화하게 됐는지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젊은이들의 뇌를 파먹는 ‘조하크의 뱀’ 전설 등 아랍권 고유 텍스트가 간간히 인용되면서 작가의 신비한 목소리에 힘을 더한다.
“처음엔 (토착)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침공으로 배신을 당한거죠. 이 배신앞에 민족주의자들, 애국자들, 지식인까지 또다른 테러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종교적 테러 말입니다.”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해독제가 더 맹렬한 독으로 화한 격’이라며 탈레반의 독재와 살육의 악순환을 분석했다.
그는 ‘음악과 축제가 되살아난’ 카불로 돌아갈 것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에 유일하게 알려진 아프간 작가인 그가 귀국 체험을 소설로 형상화할 때, 세계는 더 크게 그를 주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존심과 굴욕, 슬픔으로 얼룩진 이 민족의 내면을 찬찬히 다시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유윤종 기자 gustav@donga.com
스타일 >
-

딥다이브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현장속으로
구독
트렌드뉴스
-
1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8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9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트렌드뉴스
-
1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4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
5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6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7
연금 개시 가능해지면 年 1만 원은 꼭 인출하세요[은퇴 레시피]
-
8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9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10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4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5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6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7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8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