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개월을 돌이켜보자. 3월 초 사태가 터지고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6월 초 LH 혁신 방안은 회사를 몇 개로 쪼개는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중앙정부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 분리를 선호했다. 8월 말까지 두 차례 공청회가 있었으나 혁신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두 달 뒤 기소된 직원은 무죄가 됐다. 지금도 LH 혁신 방향조차 정하지 못했다.
LH 사태는 사업 불투명성과 독점에 기인한 것이지 직원 몇 명의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를 모자(母子)회사 구조로 바꿔 감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분석이 잘못됐다. 독점구조는 조직분산, 사업 불투명은 교차보전 포기로 해결해야 한다. 사업성이 큰 곳에서 얻은 수익을 사업성 낮은 곳에 투입하는 게 교차보전인데, 지역·사업 유형별로 사업성이 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교차보전은 LH의 투명성을 저해한다. 이득은 주로 토지 수용에서 나온다. 공공이 민간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택지와 주택으로 개발한 후, 민간에 다시 분양해 이득을 챙기는 구조다. LH의 전신 주공과 토공에서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2020년 기준, LH의 사업수익은 약 5조2000억 원이다. 이 중 교차보전은 1조9000억 원 정도인데 국가재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국가에서 LH에 교차보전 범위만큼 재정을 지원하고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에 매진하면 직원 투기는 불가능하고 사업투명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몇 년 정도 기금을 운용하다가 개발권은 지방에 이양하는 게 순리다. LH 지역본부와 광역단위 지방공사를 통폐합해 개발기능을 이관하고, LH는 주거복지에 전념하는 게 공기업으로서 갈 길이다. 그렇게 되면 대장동 같은 개발방식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국가 주도로 도시와 주택을 만들었던 1960∼7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 정부 예산도, 지자체 능력도, 국민의 요구도 다른 시대다. 변하지 않은 것은 LH가 공공의 것이란 사실뿐이다. LH는 그 길에 충실해야 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SH공사 사장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지금 뜨는 뉴스
-

美연준 인사 “연내 금리 못내릴 수도”… 日은 추가 인상 시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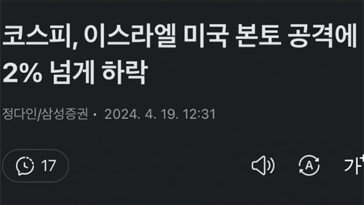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 오보…1시간 30분만에 정정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OTT처럼 방송도 편성-광고 규제 완화해야”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농촌 인력 부족, 국민 일손 돕기로 해결해야[기고/정영일]](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8/124547307.6.jpg)
![‘지구의 에어컨’ 고장 나기 전에 행동 나서야[기고/신형철]](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8/124551690.2.jpg)
![‘담배 소송’ 10년… 국민 건강 위한 역사적 판결을 기대한다[기고/정기석]](https://dimg.donga.com/a/204/115/95/2/wps/NEWS/IMAGE/2024/04/17/124527762.8.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