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지명훈]향나무 ‘문화재’ 훼손한 대전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거대한 화염 때문인지 지금도 생생하다. 2006년 11월 22일 오후 8시경이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대전 중구 선화동 당시 충남도청 정문을 두고 격렬 대치했다. 시위대가 집회에 횃불을 동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도청 안에 소방차를 대기시켰지만 허사였다. 시위대가 횃불을 도청 향나무 울타리에 던져 70년이 넘은 향나무 142그루가 커다란 불기둥과 함께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이곳으로 옮긴 뒤 얼마 안 돼 심은 것들이었다.
충남도는 방화 책임자 11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9771만여 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김 씨 등이 방화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 복구를 약속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수소문 끝에 수형이 비슷한 전북 정읍산 향나무를 옮겨다 심고 정성껏 관리했다. 예전의 기품에 미치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복구되기까지 3년 동안 도청을 지나는 시민들은 마음 한구석이 무너진 것처럼 허전해했다.
그렇게 지킨 향나무들이 15년 만에 완전히 뭉개졌다. 불법 시위대 아닌 대전시가 범인이었다. 도가 내포로 이전한 뒤 도청사를 빌려 사용해온 시는 부속 건물에 소통협력 공간을 만들면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울타리(103m)를 이룬 향나무 173그루 가운데 100그루를 베어 폐기했다. 시는 18일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 승인 없이 향나무 울타리 철거와 부속건물 리모델링을 강행한 것에 대해 주로 사과했다. 하지만 기자가 보기에 향나무 벌목은 문화재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
이 교수의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전의 뿌리인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에서 근대문화 유산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만 해도 뾰족집이 훼손됐고 대전형무소 관사와 대전지방법원 관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부서 간 소통이나 전문가 협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도 지역에 남아 있는 근대유산의 훼손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사업에 이 교수가 말한 ‘위험한 발상’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일이다.
지명훈 대전충청취재본부장 mhjee@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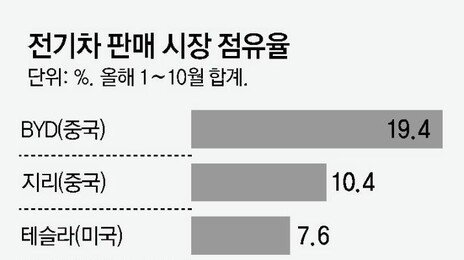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