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철학자의 어머니[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168〉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5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어머니는 병실 커튼을 젖혀 달라고 하더니 창밖에 서 있는 나무의 노란 잎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 아름답구나.” 딸은 어렸을 때 이후로 어머니가 그런 미소를 짓는 걸 본 기억이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젊은 엄마였을 때 짓던 미소였다. 일흔여덟 살의 어머니는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았다.
일종의 페미니즘 교과서인 ‘제2의 성’을 쓴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가 그 어머니의 딸이었다. 딸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10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졌다. 둘 사이의 불화와 갈등은 영원할 것 같았다. 어머니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신앙을 버리고 철학자 사르트르와의 계약결혼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딸이 너무 못마땅했다. 딸은 딸대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머니의 독선과 편견, 편협함이 싫었다. 그런데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죽어가는 어머니는 거추장스러운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순수해졌다.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것은 그래서였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독선과 편견, 허세와 원망은 설 자리를 잃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보부아르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책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보낸 마지막 6주를 회고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마지막까지 죽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던 어머니가 결국 죽음의 폭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래도 어머니와 화해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이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음에도 텅 빈 병실이 확인해주는 어머니의 부재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다. 그 상처는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회한의 감정과 섞였다. 자신만 살아 있다는 게 죄스러웠다. 보부아르처럼 냉철하고 논리적인 철학자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정말이지 속수무책이었다. 누군들 그렇지 않으랴.
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머니 컨설팅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이철희 칼럼
구독
트렌드뉴스
-
1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2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3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 비준 안해”
-
4
강남 한복판에 멈춰선 벤츠…운전자 손목엔 주사 바늘
-
5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金총리 등 영접
-
6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7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러시아로 끌려가는 북한 제대군인들
-
8
“로봇이 0.8kg 핸들 한번에 625개 옮겨, 제조원가 80%까지 절감”
-
9
[이철희 칼럼]그린란드를 보며 평택을 걱정하는 시대
-
10
트럼프 ‘경고’에 물러선 캐나다 “中과 FTA 체결 안해”
-
1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2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3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
4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 비준 안해”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6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7
‘한국선 한국어로 주문’…서울 카페 공지 저격한 외국인에 의외 반응
-
8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金총리 등 영접
-
9
이해찬 前총리 장례, 27~31일 기관·사회장 엄수
-
10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트렌드뉴스
-
1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2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3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 비준 안해”
-
4
강남 한복판에 멈춰선 벤츠…운전자 손목엔 주사 바늘
-
5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金총리 등 영접
-
6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7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러시아로 끌려가는 북한 제대군인들
-
8
“로봇이 0.8kg 핸들 한번에 625개 옮겨, 제조원가 80%까지 절감”
-
9
[이철희 칼럼]그린란드를 보며 평택을 걱정하는 시대
-
10
트럼프 ‘경고’에 물러선 캐나다 “中과 FTA 체결 안해”
-
1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2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3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
4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인상…韓국회 비준 안해”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6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7
‘한국선 한국어로 주문’…서울 카페 공지 저격한 외국인에 의외 반응
-
8
이해찬 前총리 시신, 인천공항 도착…金총리 등 영접
-
9
이해찬 前총리 장례, 27~31일 기관·사회장 엄수
-
10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밤 한 톨에 우는 아이[왕은철의 스토리와 치유]〈169〉](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0/12/02/104241859.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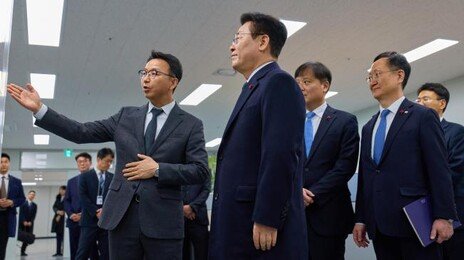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