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시론/김용희]‘핏줄 가족’ 집착 벗어나자
-
입력 2006년 5월 8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아니, 이 무슨 환청이라니. 기껏 우리는 새벽녘 아파트 콘크리트 혈관을 타고 돌아가는 보일러 소리에 얕은 잠을 뒤척이곤 하지 않는가. 자지러지듯 우는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키며 아침을 맞는다. 그렇게, 우리는 고향을, 부모를, 자연을 떠나 왔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혈연적, 정서적 존재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일제 강점과 6·25전쟁 등 격동의 근현대사에서 우리는 피눈물로 가족을 지켜 왔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때 우리는 그렇게 울었다. 또 위대한 한국의 어머니는 이국땅에서도 하인스 워드를 키워 냈다. 어머니들은 부재하는 아버지 대신 어미이자 아비이자 연인이기도 했던 것.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가족주의’가 심각하게 불거지게 된 것은 외환위기 때다. 퇴직하여 무력해진 아버지는 가족을 떠나 노숙인이 되었다. 카드 빚으로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극단적인 일도 있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며 당연한 사실이 재확인됐다. 가부장제하의 남성은 가정의 듬직한 기둥이며 엄청난 기득권도 가졌지만 숨겨진 이면에는 가족의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는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는 것. 또한 아무리 그러하기로 아버지가 가족구성원 전체의 생사를 결정할 어떤 결정권도 없다는 사실….
신경숙의 소설 ‘외딴방’에서 ‘나’는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다 함께 같이 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 반면 정정희의 소설 ‘마요네즈’에서 어머니는 반신불수로 누워 있는 아버지의 오물을 치우면서 “지겨워, 지겨워”란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아버지의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린다.
‘가족주의’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완성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가족에게 떠넘겼다. 그리하여 가족주의는 이기적 배타주의와 야만적 신화를 창조하기도 했다. 과거 국가 지도자의 아들들이 구속되고, 재력가의 아들들이 교묘하게 재산 상속을 받는 절차를 생각해 보라. 한국 사회이기에 가신(家臣)이 있고 가솔(家率)이 있고 장자 계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오, 가족은 무엇이란 말인가. 어느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살점이면서, 나를 낳고 키워 준 사랑과 감사의 궁극적 상징이자, 때로는 내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끔찍하게도 들러붙는 수초 같은 것.
8일은 가정의 달에 맞는 어버이날이다. 곧 입양의 날, 부부의 날도 온다. 가정은 행복을 얻는 기름진 밭이며,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족 형태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조부모와 사는 아이, 재혼한 아빠 또는 엄마와 사는 아이,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고 아빠가 가사를 맡는 집, 동거 남녀, 독신자, 독거노인, 입양아와 위탁아 등…. 혹 우리 사회가 변화의 속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집단적 아노미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주의가 만들어 낸 ‘가족 환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혈통적 ‘정상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혈연은 소중하지만, 그것이 삶을 강박하면 안 된다. 혈연보다는 사람이 훨씬 귀하지 않은가.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보았는가. 이제 가족은 혈연을 뛰어넘어 ‘다양한 관계의 동거인’을 달콤 쌉쌀하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김용희 평택대 교수·문학평론가
시론 >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기고
구독
-

사설
구독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장남 위장전입 의혹에…이혜훈 “결혼 직후 관계 깨져 우리와 살아”
-
4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김연경 유튜브 나온 김연아 “운동 걱정 안하고 살아 너무 좋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트렌드뉴스
-
1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2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3
장남 위장전입 의혹에…이혜훈 “결혼 직후 관계 깨져 우리와 살아”
-
4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5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6
트럼프 “그린란드에 골든돔 구축할것…합의 유효기간 무제한”
-
7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8
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김연경 유튜브 나온 김연아 “운동 걱정 안하고 살아 너무 좋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4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이혜훈 “장남 결혼직후 관계 깨져 함께 살아…이후 다시 좋아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軍 무력화하는 낮은 성인지감수성[시론/민무숙]](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1/06/07/10729737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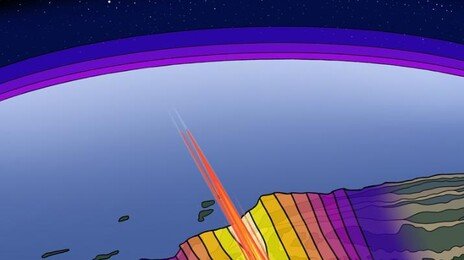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