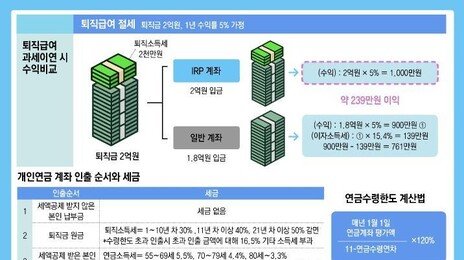공유하기
[소설]구름모자 벗기 게임(11)
-
입력 1998년 8월 1일 17시 55분
글자크기 설정
사무실은 도심에서 약간 비켜난 뒷길에 있었다. 일방 통행로를 낀 낡고 어두운 빌딩 5층. 저녁 무렵 창가에 서면 작은 철공소들이 난립해 있는 검은 도로 뒤편에 숨어 있는 홍등가의 긴 골목에 핑크빛 등들이 켜지는 것이 보였다. 사철 내내 맨다리로 나다니는 목욕통을 든 윤락녀들이 잰걸음으로 그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다. 윤락녀들은 대부분 O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맞은편 신경정신과 병원 앞, 매연에 덮인 검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저녁 바람에 흔들리면 나는 겨우 절반의 일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인쇄기를 쉬게 하고 인쇄기사와 두 명의 오퍼레이터들과 이른 저녁을 먹고 소주 두어 잔을 마셨다. 나는 직원들 앞에서도 별로 말이 없었고, 약간 지친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시간이면 더욱 기운이 빠지고 우울하고 허무한 정조에 사로잡혔다. 일은 많았지만 리스를 갚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이런 저런 부금을 갚고 사무실 세를 주면 언제나 생활비가 빠듯했다. 기기들은 낡아가고 앞날은 불투명했다. 그 즈음 우리의 저녁 시간에 방문객이 한 사람 생겼다.
어두운 복도 저편 광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영우라는 여자애였다. 영우는 광고 사무실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가씨로 어둑한 복도를 오가다가 내 사무실의 또래 오퍼레이터 아가씨들과 사귀게 된 것 같았다.
첫 느낌은 피부가 몹시 창백하고 곱다는 것이었다. 생김새는 그저 수수한 느낌이었다. 며칠 더 보니 마음이 밝고 상냥하고 붙임성이 있는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동안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낮 시간에도 틈틈이 사무실에 들러 오퍼레이터 아가씨와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점심 시간에 도시락을 들고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 함께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와 단 둘이 사는데 엄마가 식당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늘 점심 도시락의 반찬이 세 명, 네 명이 함께 먹어도 될 정도로 화려하고 푸짐했다.
어느 날 오퍼레이터 아가씨가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은 영우가오면 웃으세요. 하루에
한번도 안 웃다가 영우가 오면 웃는다구요. 아무래도 영우를 스카우트해서 우리 사무실에 앉혀 놓아야 할까봐요.
그 말을 들은 날이었다. 친구의 전화를 기다리느라 혼자 사무실에서 서성대고 있는데 영우가 문을 빼꼼 열고 고개를 디밀었다.
―언니들, 퇴근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자신이 그녀를 향해 미소짓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자각했다. 영우는 몸을 디밀고 문 앞에 잠시 붙어 서 있더니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젖혔다. 검은 단발 머리가 한쪽 어깨로 쏠리고 깊게 팬 흰색 셔츠의 칼라가 목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흰 속옷의 끈을 살짝 드러냈다. 너무나 창백한 피부에 가만히 쳐다보는 눈은 아주 검고 꼭 다문 입술은 어두운 분홍빛이었다. 약간 통통한 몸매에 청바지를 입고 굽이 낮은 단화 차림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순수한 얼굴인데도 왠지 자극적인 암내를 풍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우는 스물 여섯 살이었다. 나이에 비해 인상은 아주 소녀적이었다.
―사장님 우리 영화 보러 안 갈래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거의 10시30분이었다.
<글:전경린>
총선 : 시민단체 >
-

현장속으로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트렌드뉴스
-
1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2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3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5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6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7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8
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
9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근시’…원인은 전자기기 아닌 ‘빛 부족’
-
10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7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트렌드뉴스
-
1
취권하는 중국 로봇, ‘쇼’인 줄 알았더니 ‘데이터 스펀지’였다?[딥다이브]
-
2
다카이치가 10년 넘게 앓은 ‘이 병’…韓 인구의 1% 겪어
-
3
트럼프, 분노의 질주…“글로벌 관세 10%→15%로 인상”
-
4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5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6
“개인회생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통보받은 세입자가 할 일
-
7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8
李대통령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 기적의 논리”
-
9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근시’…원인은 전자기기 아닌 ‘빛 부족’
-
10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1
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0여명, ‘절윤 거부’ 장동혁에 사퇴 촉구
-
2
목줄 없이 산책하던 반려견 달려들어 50대 사망…견주 실형
-
3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4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5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
6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7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8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9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10
‘면직’ 산림청장, 술 취해 무법질주…보행자 칠뻔, 車 2대 ‘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