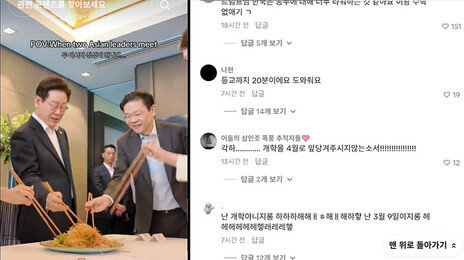공유하기
[소설]봉순이 언니(49)
-
입력 1998년 6월 21일 20시 39분
글자크기 설정

우리가 장에 다녀왔을 때 봉순이 언니는 엷은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문간방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엉성하고 커다란 월남치마를 입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 스웨터의 커다란 단추 몇개가 떨어져 나간 것이 처음에 눈에 띄었다. 그녀의 곁에는 집을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진갈색 비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우리가 장에 간 사이 집을 보아달라고 부탁했던 이웃집 할머니는 봉순이 언니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언니는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얼른 툇마루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내쪽에서 그녀의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낌은 있었다. 그녀는 바람 든 무우처럼 공허하고 부어보였다.
―짱아, 가서 대문 닫아 걸어라!
기가 막히다는 듯 잠시 말을 못하고 있던 어머니는 뜻밖에도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걸라는 소리로 보아서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내쫓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그녀와 나는 잠시 멍했다. 마당에는 그녀와 나 둘만이 남아 있었다. 글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데도 내가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한 다섯달 쯤의 짧은 별리였지만 나는 내가 그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굳은 듯 서 있는 나의 눈이 봉순이 언니의 그것과 마주쳤다.
봉순이 언니의 눈가에는 푸르스름한 멍자욱이 남아 있었고, 다시 보니 입술 위쪽이 터져 있어서 가뜩이나 두툼한 입술이 더 두터워 보였다. 그런데 그렇게 둘의 눈이 마주친 그 때, 뜻밖에도 봉순이 언니는 빨간 잇몸을 드러내며 씨익 웃었다. 어린 마음에도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기억난다. 어떻게 언니는 웃을 수가 있는 거야, 싶은 생각,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였다. 어색한 기분에 그녀를 따라 웃어주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봉순이 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사온 김칫거리들을 장바구니에서 풀더니 부엌으로 가져가 씻기 시작했다.
마치 그제쯤 여행을 떠났다가 방금 돌아온 사람 같았다. 아니, 이제껏 내내 집에서 산 사람이래도 그렇게 태연할 수는 없으리라.
<글:공지영>
총선 : 여론조사 >
-

이준일의 세상을 바꾼 금융인들
구독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머니 컨설팅
구독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트렌드뉴스
-
1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2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3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4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5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6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7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8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9
“뇌에 칩 심겠다”…시각장애 韓유튜버, 머스크 임상실험 지원
-
10
“장동혁 서문시장 동선 따라 걸은 한동훈…‘압도한다’ 보여주려”[정치를 부탁해]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4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지명…‘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권익위원장
-
5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6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7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10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여론조사/내년총선 지지정당]40代이상-한나라 30代-신당](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