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선수에서 심판으로… 현숙희, 25년만에 올림픽 무대 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일 15시 4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020 도쿄 올림픽 유도 경기가 진행된 일본 도쿄 지요다구 일본부도칸에 25년 만에 올림픽과 재회한 이가 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유도 여자 52kg급 은메달리스트 현숙희 심판위원(48)이다.
스물 셋의 나이로 유도복을 입고 올림픽 매트를 밟았던 현 위원은 마흔 여덟이 돼 이번엔 심판 재킷을 입고 올림픽 무대에 섰다. 지난달 31일 모든 유도 경기가 끝나면서 1일 귀국했다.
사실 유도 선수보다 심판에게 올림픽 바늘구멍은 더 좁다. 선수의 경우 남여 총 14체급에 각각 20여 명씩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지만 심판은 전 세계 단 16명만이 기회를 얻는다. 꾸준히 국제대회에 참여해 포인트도 관리해야 한다. 오심은 물론 운영까지 매 경기마다 점수가 매겨진다. 국제유도연맹(IJF) 심판랭킹 13위인 현 위원도 올해 들어서만 올림픽 전까지 4개 국제대회에 나섰다.

올림픽이 주는 특별함은 심판에게도 마찬가지다. 유도 대표 안창림의 천적이자 남자 73㎏금메달리스트 오노 쇼헤이(일본)의 준결승전 주심을 맡기도 했던 현 위원은 “최고의 무대에서 맞붙는 선수들의 눈빛을 바로 앞에서 보니 느끼는 바가 많았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모른다는 명제도 다시 익혔다”고 했다. 서울 광영여고 체육교사로 유도부 학생들도 지도하고 있는 현 위원은 “올림픽에서 본 선수들의 장단점을 메모해 놨다.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생각”이라며 웃었다. 현 위원의 둘째아들은 청소년 농구 국가대표 포워드 김태훈(고려대)이기도 하다.
‘노 골드’에 그친 한국 유도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 한국 유도는 이번에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지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걸지 못했다. 현 위원이 선수로 뛰던 1990년대 중반은 한국 유도의 전성기였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현 위원은 조민선, 정선용, 정성숙과 여자유도 세계 최강 4총사로 이름을 날렸다. 현 위원은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 도쿄올림픽 >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3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6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7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8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9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0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트렌드뉴스
-
1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2
길고양이 따라갔다가…여수 폐가서 백골 시신 발견
-
3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4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5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6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중 2개 유죄… 법원도, 검찰도 부끄러운 일
-
7
“태국서 감금” 한밤중 걸려온 아들 전화…어머니 신고로 극적 구조
-
8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9
이웃집 수도관 내 집에 연결…몰래 물 끌어다 쓴 60대 벌금형
-
10
마운자로-러닝 열풍에 밀린 헬스장, 지난달에만 70곳 문닫아
-
1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R석 7만9000원’ 한동훈 토크콘서트…한병도 “해괴한 정치”
-
8
李 “설탕부담금,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
9
李, 또 ‘설탕부담금’…건보 재정 도움되지만 물가 자극 우려
-
10
“합당 멈춰라” “당무개입 말라”… 김민석-정청래 당권다툼 전초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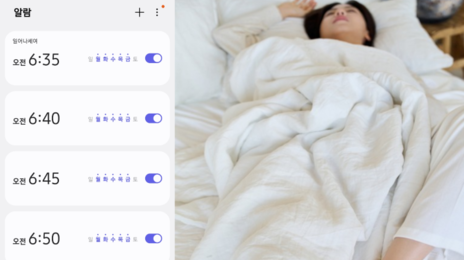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