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라도 천년]아! 뜨거운 생명력이여… 황토 빛 들판에 ‘천년花’가 피었네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전라도 3개 시도(전북·전남·광주광역시)가 정한 전라도 천년나무는 느티나무다. 일명 ‘해를 매달아 놓았던 나무’이다. 해남 대흥사 뒤편의 두륜산에 천년이 넘도록 묵묵히 서 있다. 높이 22m, 둘레 9.6m. 어른 예닐곱이 두 팔을 벌려야 닿을 정도로 품이 넓다. 대흥사 뒤쪽 두륜산은 영락없이 부처님이 누워있는 형상이다. 두륜봉이 부처님 머리, 가련봉이 부처님 가슴, 노승봉이 부처님 손, 고계봉이 부처님 발의 형상이다. 전라도 천년나무는 바로 부처님가슴 형상의 가련봉 아래 만일암 터에 자리 잡고 있다. 옥황상제의 천동과 천녀가 이 느티나무에 해를 매달아 놓고 북미륵암의 마애여래좌상(국보 제308호)과 남미륵암의 마애여래입상을 조각했다는 전설이 서려 있다. 여래상은 곧 현생을 주관하는 석가모니부처를 뜻한다.
전북 김제 모악산 금산사와 전남 화순 운주사 일대는 바로 전라도 중생들의 미륵부처에 대한 간절함이 배어있는 곳이다. 모악산 아래에는 ‘오리알터’로 불리는 저수지 ‘올(來)터’가 있다. 누가 오는가. 바로 미륵부처가 온다는 뜻이다. 아직도 이 주위에는 미륵계통의 신흥종교가 몰려있다. 역시 이곳에서 조선시대 혁명아 정여립(1546∼1589)이 서른아홉 때 한양의 벼슬을 버리고 터를 잡고 살았고 강증산(1871∼1909)은 정여립 집터 바로 옆 구릿골에 약방(광제국)을 차려놓고 여성, 백정, 무당, 광대가 존경받고 서자와 상민이 무시당하지 않는 후천개벽의 세상을 역설했다. 녹두장군 전봉준(1855∼1895)도 오리알터 아래 감곡 황새마을에서 감수성 많은 청소년시절을 보내며 김덕명과 손화중을 평생 동지로 사귀었다. 화순 운주사는 ‘1000개의 부처와 1000개의 탑을 만들면 미륵부처님이 내려 오신다’는 전설의 현장이다. 골짜기 안에는 중생들이 투박하게 빚어놓은 못난이 돌부처들이 아직도 개벽의 세상을 꿈꾸며 서있다.
전라도는 이 땅의 역사에서 ‘야지(野地)’임에 틀림없다. ‘들판의 역사’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땅, 벌판이 가장 많은 땅, 때로는 들불처럼 타오르며 석양을 벌겋게 물들였고 가끔은 ‘변방의 우짖는 새’로서 그 서러움에 꺼이꺼이 목 놓아 울었다. 하지만 꽹과리, 징, 장구, 북의 사물놀이처럼 시끄러운 듯 황홀하고 무질서한 듯 어우러지며 옹골지고 신명나게 살았다. 그 속엔 변방의 활달하고 자유로운 정신이 녹아있다. 드넓은 김제만경·나주 들판의 평등정신과 짠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대동정신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은 전라도 천년의 소중한 주춧돌이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전라도 사람들의 활달한 정신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안성맞춤이다. 새판을 짜고 불판을 전면적으로 갈아엎는데 적격이다. 자고나면 휙휙 바뀌는 세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살 수 있다. 천년동안 변방이었던 전라도에 둘도 없는 기회다. 전라도는 생명자본의 땅이다. 생명을 키우는 너른 들판과 바다 그리고 수많은 섬들이 바로 그 현장이다.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의 줄기찬 생명력과 자유스러운 영혼이 어우러지면 개벽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수 있다.

글=김화성 ‘전라도 천년’ 저자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3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4
“차 대지마” 주차장 바닥에 본드로 돌 붙인 황당 주민 [e글e글]
-
5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6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7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작업…기업 자체 판단”
-
8
부상 선수 휠체어 밀어준 김상식, 베트남 사로잡았다
-
9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10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
6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7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
8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9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10
국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중징계… 張-韓 갈등 심화
트렌드뉴스
-
1
배우 얼굴 가린다고…아기 폭우 맞히며 촬영, ‘학대’ 논란
-
2
‘린과 이혼’ 이수, 강남 빌딩 대박…70억 시세 차익·159억 평가
-
3
“李는 2인자 안둬…조국 러브콜은 정청래 견제용” [정치를 부탁해]
-
4
“차 대지마” 주차장 바닥에 본드로 돌 붙인 황당 주민 [e글e글]
-
5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6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7
中외교부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작업…기업 자체 판단”
-
8
부상 선수 휠체어 밀어준 김상식, 베트남 사로잡았다
-
9
“전격 숙청된 중국군 2인자 장유샤, 핵무기 정보 美 유출 혐의”
-
10
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
1
이해찬 前총리 시신 서울대병원 빈소로…31일까지 기관·사회장
-
2
트럼프 “韓 車-상호관세 25%로 원복…韓국회 입법 안해”
-
3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北수령론 같아…정상 아냐”
-
4
협상끝난 국가 관세복원 처음…조급한 트럼프, 韓 대미투자 못박기
-
5
국힘 윤리위, 김종혁에 ‘탈당권유’ 중징계…친한계와 전면전?
-
6
李 “아이 참, 말을 무슨”…국무회의서 국세청장 질책 왜?
-
7
조정식·윤호중·김태년·강기정…‘이해찬의 사람들’ 곳곳에 포진
-
8
與 “통과시점 합의 없었다” vs 국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미적”
-
9
李 “힘 세면 바꿔준다? 부동산 비정상 버티기 안돼”
-
10
국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중징계… 張-韓 갈등 심화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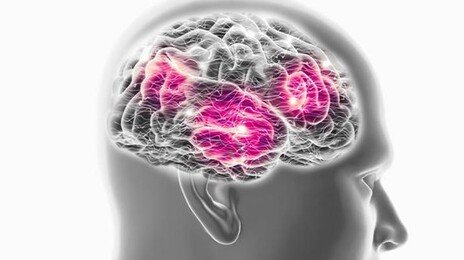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