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멍 뚫린 구제역… ‘첫단추’부터 잘못된 방역대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5일 03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질문서 한장 달랑 주고, 입국검역 “통과, 통과…”

지난해 5월, 방역 당국은 앞서 4월 인천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력한 원인으로 축산농민의 중국 방문을 꼽았다. 구제역 발생국인 중국을 여행하고 오면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후 방역 당국은 공항, 항만 등 국경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도 축산농가의 구제역 위험국가 방문이 구제역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국경 검역이 또 뚫린 셈이다. 실제로 입국 검역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최근 구제역 위험국가를 방문하고 온 축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짚어 봤다.
○ 스스로 찾아가 검역하라?
A 씨 일행이 입국한 것은 12월 3일 오전 7시. 게이트 입구에는 빨간색 카펫이 깔려 있었다. 이 카펫은 신발을 소독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소독조’로 설치한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 A 씨는 검역소에 ‘검역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여행지를 ‘베트남’이라고 적었다. 통과. 베트남은 구제역 위험국가지만 아무런 제지도 없었다.
다음은 입국 심사대. 여권을 제출하고 입국 도장을 받고, 다시 여권을 돌려받는 동안 직원은 아무 말이 없었다. 방역 당국은 5월에 “농장주,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들의 여권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의 DB는 아직도 법무부와 공유되지 않아 공항에서 축산 종사자를 걸러낼 수 없다. 농식품부는 뒤늦게 법무부와 DB를 공유해 축산 관계자의 경우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A 씨는 일행과 함께 동물방역과 사무실을 찾았다. 물론 “검역을 하고 가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A 씨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방역과를 찾은 것”이라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이 많은 농장주들끼리 입국할 경우 모르고 그냥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외국에 갔다 온 2만6000여 명의 축산 관계자 중 9400여 명이 방역과를 ‘그냥 지나쳤다’. 방역과 사무실에는 여직원 한 명만 있었다. A 씨 일행은 신발, 옷을 소독했다. 문제는 가방. A 씨는 “가방의 경우 원하는 사람만 하라면서 액체 소독약을 나눠 줬다”고 말했다.
○ ‘검역 교육’을 한다지만…
충북에서 한우를 키우는 H 씨(56)는 검역을 받지 않은 9400여 명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여름 중국을 방문했던 그는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중국과 동남아가 구제역 위험국가라는 사실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검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검역을 하지 않는 농가는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H 씨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중국을 방문했던 충남의 농장주 J 씨(55)는 “입국할 때 신고하고 검역을 받으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와서 검역을 받았다”며 “그 전후에 다른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기억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같이 주먹구구식 교육이 이뤄지는 동안 축산 종사자들은 꾸준히 외국을 찾고 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축산 관련 관리 대상은 약 20만 명. 이 중 여권을 보유한 사람은 10만3000명이다. 농협, 축협 조합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NH여행사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함께 가는 경우와 이웃 간 친목계에서 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고령이라서 가깝고 싼 동남아, 중국 지역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동남아와 중국은 구제역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이다.
○ 관리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
방역 당국은 지난해 1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외국인 근로자의 물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규모가 큰 양돈, 젖소 농가에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고 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700명. 그러나 불법 체류자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관련 협회나 정부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돼지 5000마리를 기르는 Y 씨(60)는 중국인 3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의 월급은 100만∼150만 원. Y 씨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하려는 한국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비슷한 규모의 양돈농장은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검역 관리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 방역 교육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한다. 입출국은 자유롭다.
축산농가의 해외여행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부의 허술한 검역과 일부 축산농가의 안일한 방역 의식이 맞물려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2000, 2002, 2010년에 걸쳐 모두 다섯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가 바뀌어도 축산 농가의 피눈물은 계속되고 온 나라는 여전히 홍역을 앓고 있다.
‘구제역 백신’ 돼지도 접종 검토
▲2011년 1월4일 동아뉴스스테이션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5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6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7
[단독]‘국보’로 거듭난 日 배우 구로카와 소야…“올해 한국 작품 출연”
-
8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9
영덕 풍력발전기 갑자기 쓰러져 도로 덮쳐…인명 피해 없어
-
10
李대통령, ‘골든’ 그래미 수상에 “K팝 역사 새로 썼다…뜨거운 축하”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트렌드뉴스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3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4
운전 중 ‘미상 물체’ 부딪혀 앞유리 파손…50대女 숨져
-
5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6
바닷가 인근 배수로서 실종된 20대 여성…18시간 만에 구조
-
7
[단독]‘국보’로 거듭난 日 배우 구로카와 소야…“올해 한국 작품 출연”
-
8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9
영덕 풍력발전기 갑자기 쓰러져 도로 덮쳐…인명 피해 없어
-
10
李대통령, ‘골든’ 그래미 수상에 “K팝 역사 새로 썼다…뜨거운 축하”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7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10
이준석 “與-정부 다주택자, 5월9일까지 집 팔 건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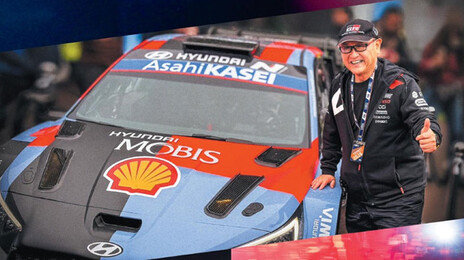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