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통신선 복구 北 ‘깜짝쇼’…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 주간동아
-
입력 2021년 8월 7일 11시 00분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 백신·식량 노림수 가능성

북한은 6·25전쟁 정전일을 ‘전승절’이라 부르며 김일성 주석 생일과 같은 명절로 여긴다. 북한식으로 68주년 전승절인 7월 27일 오전 11시,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이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해오다 오늘 오전 10시부로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5분 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북남 수뇌들께선 여러 차례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해 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는 데 대해 합의하셨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기자실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폐쇄된 상태라 기자들은 받은 자료로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기자실 폐쇄해놓고 중대 발표
정부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판문점 통신선,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복원만 밝혔다.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본부청사를 잇는 일명 ‘핫라인’의 복원은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 간) 핫라인 통화는 차차 논의할 사안”이라고 했다. 핫라인이 끊겼다는 것은 북한의 발표로 확인된다. 지난해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오던 북남 당국 사이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판문점 통신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한다”고 보도했다.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복구한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해 여름 북한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올여름엔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데다 태풍 북상까지 예상되자 ‘노동신문’은 연일 풍수해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수입 실적도 공식적으로 전무(全無)한 상태다. 한미연합군이 훈련하면 인민군도 대응 기동을 해야 하는데, 이때 코로나19가 극성할 수 있다. 통신연락선 연결 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마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뒤통수에 파스, 밴드 등으로 추정되는 것을 붙이고 나타났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붙이고 나온 ‘파스’는 한국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해석했다.

“깜짝쇼 상투적 수법”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도 이 같은 라인 덕분에 가능했다고 알려졌다. 핫라인은 천안함 폭침과 201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 결정으로 차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연결하는 비밀 라인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덕에 국정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북한 측 ‘사과’ 통지문을 받고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도 통보받을 수 있었다.전승절을 맞은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다시 잇는 ‘깜짝쇼’를 벌인 것과 관련해 북한 전문가들은 “깜짝쇼는 옛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상대를 감동시켜 자기 의도대로 국면을 펼치려 할 때 쓰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풀이한다. 통신연락선 복원에 숨은 북한의 속셈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남북 핫라인 둘러싼 설왕설래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 방북한 한국 기자들은 ‘남북 핫라인 설치’를 주요 합의로 알렸다. 다만 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6·15 공동선언문에도 빠졌기에 까맣게 잊혔다.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씨가 2008년 회고록 ‘피스메이커’에서 “핫라인 설치는 (1차) 정상회담 최대 성과 중 하나” “2002년 6월 서해교전(2차 연평해전), 10월 2차 북핵 위기, 2003년 임동원 특사 방북 등 주요 현안에 핫라인이 사용됐다”고 밝혔으나 주목받지 못했다. 2015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2008-2013’에도 핫라인 존재가 언급됐으나 역시 관심받지 못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가 2015년 10월 2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핫라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김씨는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다는 뜻이지,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무현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씨도 2016년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노무현 정부가 핫라인으로 북한에 의견을 물어봤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5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트렌드뉴스
-
1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2
“어깨 아프면 약-주사 찾기보다 스트레칭부터”[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
3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6
日 소니마저 삼킨 中 TCL, 이젠 韓 프리미엄 시장 ‘정조준’
-
7
“총리공관서 與당원 신년회 열어” 김민석 고발당해
-
8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9
AG 동메달 딴 럭비선수 윤태일, 장기기증으로 4명에 새 삶
-
10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2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5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6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7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8
정청래, 장동혁에 “살이 좀 빠졌네요”…이해찬 빈소서 악수
-
9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10
세결집 나서는 韓, 6월 무소속 출마 거론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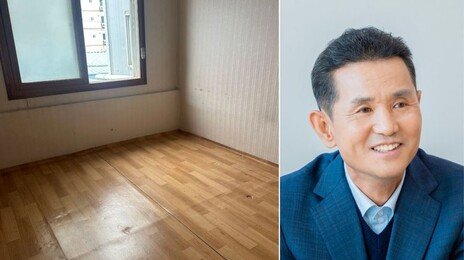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