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盧 핵심공약 중간점검]전문가 총평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글자크기 설정
연 7%대의 성장, 빈부격차의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재정 건전성 제고와 근로자 조세경감 등 경제·복지 분야 공약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아예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자주적 군사외교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고, 행정수도 건설이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도 집행 과정에 많은 불확실성이 가로놓여 있으며 분권은 말로만 요란하다는 혹평이 있다. 재벌 개혁,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같은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결국 3년 전 대선 공약은 비전을 만들고 표 모으기에 동원된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마감 2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특히 국리민복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냉철한 선택과 정권적 에너지의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 정책이 중요하다. 국내 시각에 갇혀 미시정책을 통한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모래성 쌓기와 같다.
안정과 균형을 기본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마인드를 갖고 경제 활력 찾기에 집중하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공약을 만들 때는 분야별로 독립적이라고 보았던 문제들이 3년간의 국정운영을 경험한 이 시점에서 보면 대부분 경제 활성화에 연결돼 있다는 점을 깨쳤을 것이다.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저소득층이 희망을 갖게 되면 시민의 손과 시장의 힘으로 공약들이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구조와 틀의 개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지금 정부에는 정부 운영을 세계적 추세에 맞추고 정체된 경제-사회의 바퀴를 움직이면서 미진한 공약사항의 결실을 얻으려는 동태적 자세가 필요하다.
 |
공약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정책, 경제 상황과 정합도가 떨어지는 농어촌정책, 상극 관계에 있는 대기업정책 등에 내재된 각종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 에너지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정책시스템의 경량화와 ‘기마병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남은 시간 동안 정부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트렌드뉴스
-
1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2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3
“친미의 대가” 걸프 6개국 때리는 이란…중동 진출 빅테크도 타깃
-
4
만취女 성폭행한 세 남자…“합의하면 되나” 현장서 AI에 물었다
-
5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6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7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8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9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용서 구한다”
-
10
“개학 늦춰주세요” 李대통령 틱톡 몰려간 학생들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4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8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트렌드뉴스
-
1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2
미스 이란 출신 모델 “하메네이 사망, 많은 국민이 기뻐해”
-
3
“친미의 대가” 걸프 6개국 때리는 이란…중동 진출 빅테크도 타깃
-
4
만취女 성폭행한 세 남자…“합의하면 되나” 현장서 AI에 물었다
-
5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6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7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8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9
‘文정부 치매’ 발언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용서 구한다”
-
10
“개학 늦춰주세요” 李대통령 틱톡 몰려간 학생들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4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8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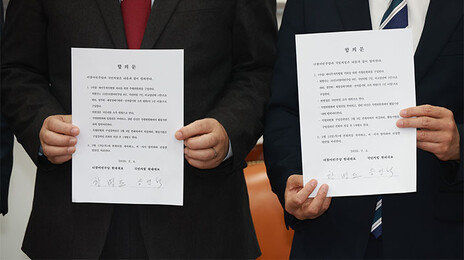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