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지우기 갈등겪는 유럽… 새 대안 찾기 움직임 활발[광화문에서/김윤종]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6일 오후 프랑스 파리 7구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정문 오른쪽에 위치한 동상 뒤로 경찰 4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기자가 동상 주위를 맴돌자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다.
동상의 주인공은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이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1619∼1683). 콜베르는 중상주의(重商主義) 정책을 앞세워 프랑스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노예법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동상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경계를 강화한 것이다.
미국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反)인종차별 시위가 유럽으로 번지며 노예제, 인종주의와 관련된 역사 속 인물들의 동상이 훼손되고 있다. 샤를 드골 전 대통령 동상마저 그가 알제리 독립운동을 탄압했다는 이유로 페인트 공격을 받았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동상도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1800년대 의무교육을 실시해 ‘프랑스 공교육의 아버지’로 불린 쥘 페리 전 총리의 이름이 들어간 파리 시내 학교들도 명칭을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페리 전 총리가 인종주의 발언을 한 탓이다. 파리 16구의 뷔조 거리 역시 사라질 판이다. 거리 이름이 19세기 알제리인 학살을 주도한 장군 토마 로베르 뷔조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의 잣대로 역사 속 인물을 단죄해 거리와 건물 이름을 삭제하거나 동상을 부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역사에서 그 어떤 흔적도 지우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시베트 은디아예 정부 대변인은 “인종 차별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일부 이름은 지울 필요가 있다”며 찬성했다.
찬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 더 큰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우려됐다. 그러자 중립적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 시민운동가는 파리 시내 도로 표지판 옆에 1920년 흑인 여성 최초로 소르본대에 입학한 폴레트 나르달의 이름을 넣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화제가 됐다. 갈등을 키우며 이름을 삭제하기보다는 인종 평등에 기여한 새로운 인물도 거리나 건물 이름에 많이 담아내자는 아이디어다.
과거를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아픈 역사를 눈가림하는 것도 현재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사 지우기 찬반 갈등을 ‘제3의 길’로 극복하려는 건설적 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김윤종 파리 특파원 zozo@donga.com
광화문에서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밑줄 긋기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알쓸톡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호선, ‘무속 예능’ 1번 만에 중도 하차…이유 직접 밝혔다
-
2
파나마 대법원의 극적 반전 판결… 미국, 파나마 운하 통제권 사실상 되찾아
-
3
9000m 상공서 기내 집단 난투극…이륙 3시간만 비상착륙(영상)
-
4
美국방차관, 유럽 압박하며 韓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
5
‘각자 명절’ 보내는 요즘 부부들…“집안일-스트레스서 해방”
-
6
11년 공짜 세금 끝…절벽에 선 中전기차 시장 ‘최후 생존게임’[딥다이브]
-
7
5000 뚫은 韓증시…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이번엔 들어갈까
-
8
‘왕과 사는 남자’ 300만 돌파…류승완표 ‘휴민트’ 100만 넘어
-
9
‘다카이치 2기’ 출범…‘강한 일본’ 경제-안보 밑그림 나온다
-
10
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
1
홍준표, 한동훈·배현진 겨냥?…“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
2
李대통령 부부, 설 인사…“‘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
3
與 “6주택 장동혁 입장 밝혀라” 野 “李, 분당 복귀 여부 답하라”
-
4
“친이-친박땐 대권 경쟁, 지금은 감정싸움”…野 계파 갈등 잔혹사
-
5
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
6
장동혁 “불효자는 웁니다”…李 저격에 시골집 사진 올리며 맞불
-
7
‘각자 명절’ 보내는 요즘 부부들…“집안일-스트레스서 해방”
-
8
1억 그림-집사 게이트 ‘줄무죄’…사실상 7전 5패 김건희 특검
-
9
권성동의 옥중편지…“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
-
10
장동혁, 李에 “국민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아…분당집 처분할지 답하라”
트렌드뉴스
-
1
이호선, ‘무속 예능’ 1번 만에 중도 하차…이유 직접 밝혔다
-
2
파나마 대법원의 극적 반전 판결… 미국, 파나마 운하 통제권 사실상 되찾아
-
3
9000m 상공서 기내 집단 난투극…이륙 3시간만 비상착륙(영상)
-
4
美국방차관, 유럽 압박하며 韓 ‘콕’ 집어 언급한 이유는
-
5
‘각자 명절’ 보내는 요즘 부부들…“집안일-스트레스서 해방”
-
6
11년 공짜 세금 끝…절벽에 선 中전기차 시장 ‘최후 생존게임’[딥다이브]
-
7
5000 뚫은 韓증시…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이번엔 들어갈까
-
8
‘왕과 사는 남자’ 300만 돌파…류승완표 ‘휴민트’ 100만 넘어
-
9
‘다카이치 2기’ 출범…‘강한 일본’ 경제-안보 밑그림 나온다
-
10
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
1
홍준표, 한동훈·배현진 겨냥?…“신의 저버린 배신자, 재기한 역사 없다”
-
2
李대통령 부부, 설 인사…“‘모두의 대통령’으로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
-
3
與 “6주택 장동혁 입장 밝혀라” 野 “李, 분당 복귀 여부 답하라”
-
4
“친이-친박땐 대권 경쟁, 지금은 감정싸움”…野 계파 갈등 잔혹사
-
5
국방부, 육사가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 맡긴다
-
6
장동혁 “불효자는 웁니다”…李 저격에 시골집 사진 올리며 맞불
-
7
‘각자 명절’ 보내는 요즘 부부들…“집안일-스트레스서 해방”
-
8
1억 그림-집사 게이트 ‘줄무죄’…사실상 7전 5패 김건희 특검
-
9
권성동의 옥중편지…“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
-
10
장동혁, 李에 “국민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아…분당집 처분할지 답하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광화문에서/박훈상]‘만독불침’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2/13/13336682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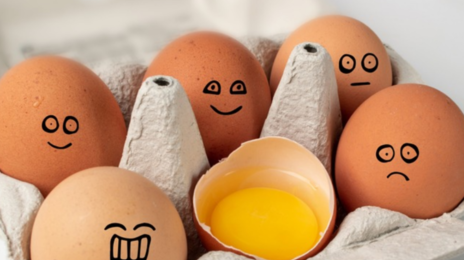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