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박재명]연평도는 아직도 戰時상태
- 동아일보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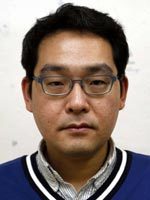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섬을 찾은 기자들에게 자전거는 귀중한 교통수단이다. 연평면사무소 앞에는 주민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떠난 자전거가 넘쳐난다. 차량이 없는 기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섬 곳곳에 산재한 포격 현장을 돌아다닌다. 연평도의 밤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다. 밤에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골목을 돌다 보면 전신주에 걸린 가로등 외에는 불빛을 발견할 수 없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다. 골목길에는 어김없이 타다 남은 이불과 깨진 유리창 조각이 흩어져 있다. 불이 꺼진 집 사이로 포격으로 불탄 집이 여러 채 보였다.
연평도에는 북측의 포격 도발로 파손된 집이 100여 채가 넘는다. 며칠 전만 해도 그 집에서는 손자의 재롱을 보고 즐거워하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모든 것이 무너진 연평도에는 가족이 없었다.
기자는 25일 군의 출입 통제가 풀려 연평도에 들어오기 전까지 연평도가 ‘전시(戰時)’라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이곳이 사실상 전쟁터임을 식사 때가 돼서야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다. 연평도에 쌀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가 구호 식량을 가져왔지만 이미 모두 동났다. 라면과 군에서 보급 받은 전투식량 두 가지를 ‘교대로’ 먹는 수밖에 없었다. 26일 기자의 하루 식단은 라면과 전투식량, 그리고 또 전투식량이었다.
박재명 사회부 jmpark@donga.com
기자의 눈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이설의 한입 스토리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전승훈 기자의 아트로드
구독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이란 대통령 “사과” 몇 시간 만에 또 공습…걸프국 “보복 경고”
-
4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5
트럼프, 쿠르드족 또 외면하나…“이란戰 개입 원치않아”
-
6
중동 변수에 시험대 오른 ‘코스피 8000’ 장밋빛 전망
-
7
세번째 ‘음주물의’ 이재룡…아내 유호정 과거 발언 재조명
-
8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9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10
“선태님 개업 축하” 맨유도 줄섰다…前충주맨 채널 ‘댓글 마케팅’ 화제
-
1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2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3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4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5
나경원 “오세훈 시장 평가 안 좋아…남 탓 궁색”
-
6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7
배우 이재룡, 교통사고 뒤 도주…체포 당시 음주 상태
-
8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9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10
美, 이란 3000곳 타격-43척 파괴…트럼프 “10점 만점에 15점”
트렌드뉴스
-
1
1평 사무실서 ‘월천’… 내 이름이 간판이면 은퇴는 없다[은퇴 레시피]
-
2
한국 성인 4명 중 1명만 한다…오래 살려면 ‘이 운동’부터[노화설계]
-
3
이란 대통령 “사과” 몇 시간 만에 또 공습…걸프국 “보복 경고”
-
4
트럼프가 보조금 끊자…美 SK 배터리 공장 900여명 해고
-
5
트럼프, 쿠르드족 또 외면하나…“이란戰 개입 원치않아”
-
6
중동 변수에 시험대 오른 ‘코스피 8000’ 장밋빛 전망
-
7
세번째 ‘음주물의’ 이재룡…아내 유호정 과거 발언 재조명
-
8
국힘 지도부 ‘서울 안철수-경기 김은혜’ 출마 제안했다 거부당해
-
9
미국은 미사일이 부족하다? 현대전 바꾼 ‘가성비의 역습’[딥다이브]
-
10
“선태님 개업 축하” 맨유도 줄섰다…前충주맨 채널 ‘댓글 마케팅’ 화제
-
1
한동훈 “尹이 계속 했어도 코스피 6000 갔다…반도체 호황 덕”
-
2
李 “대통령·집권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돼…권한만큼 책임 커”
-
3
美외교지 “李 인기 비결은 ‘겸손한 섬김’…성과 중시 통치”
-
4
‘패가망신’ 경고, 李 취임 후 10여번 써…주가-산재 등 겨냥
-
5
나경원 “오세훈 시장 평가 안 좋아…남 탓 궁색”
-
6
오세훈, 장동혁에 “리더 자격 없다…끝장토론 자리 마련하라”
-
7
배우 이재룡, 교통사고 뒤 도주…체포 당시 음주 상태
-
8
[사설]지지율 연일 바닥, 징계는 법원 퇴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나
-
9
홍준표 “통합 외면 TK, 이제와 읍소…그러니 TK가 그 꼴된 것”
-
10
美, 이란 3000곳 타격-43척 파괴…트럼프 “10점 만점에 15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KLPGA, 시드권 특전 주며 스스로 권위 날렸다[기자의 눈/김정훈]](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89.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