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기자의 눈/성동기]유엔기후협약 입다문 한국 대표
-
입력 2007년 12월 18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회의장에서 만난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중진국인 한국은 선진국같이 얘기할 수도, 개발도상국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애매한 처지”라는 게 그의 군색한 설명이었다.
15일 폐막한 이번 총회에는 186개국이 참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새 협약에 의무감축 가이드라인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끝까지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향한 큰 변화로 평가받는 ‘발리 로드맵’은 이런 치열한 과정을 거쳐 채택됐다.
하지만 한국은 2주의 총회 기간 내내 뒷짐을 쥔 ‘방관자’로 머물렀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한국 정부의 주장은 총회 기간 중 확인하기 어려웠다. 반전을 거듭하는 ‘환경 외교전(戰)’의 와중에서 한국 대표단은 돌아가는 상황 파악에만 급급했다.
한국 대표단의 모습은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앞장서 대변한 중국마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당 에너비 소비량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과 분명한 대비가 됐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규용 환경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을 때에 옵서버로 회의를 지켜보던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이 야유를 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발리 로드맵 최종 발표를 앞두고 각국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던 15일 아침 발리를 떠났다.
총회가 폐막된 뒤 한국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국은 정부 안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익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시기는 2013년. 시한이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준비 태세를 보며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 어려웠다. ―발리에서
성동기 사회부 esprit@donga.com
빛나는 조연 >
-

특파원 칼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2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3
김경 시의원 사퇴…“강선우에 1억 제 불찰, 상응한 처벌 받겠다”
-
4
‘더 글로리’ 차주영 활동 중단…“반복적 코피, 수술 미루기 어려워”
-
5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6
‘얼음폭풍’ 美전역 강타…22개주 비상사태-100만가구 정전
-
7
84세 맞아? 마사 스튜어트 광채 피부 유지 비결은?
-
8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9
라면 먹고도 후회 안 하는 7가지 방법[노화설계]
-
10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1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
2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3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4
李,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
6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7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8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9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10
한동훈 제명 두고 국힘 ‘폭풍전야’…장동혁 복귀후 직접 마무리할 듯
트렌드뉴스
-
1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2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3
김경 시의원 사퇴…“강선우에 1억 제 불찰, 상응한 처벌 받겠다”
-
4
‘더 글로리’ 차주영 활동 중단…“반복적 코피, 수술 미루기 어려워”
-
5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6
‘얼음폭풍’ 美전역 강타…22개주 비상사태-100만가구 정전
-
7
84세 맞아? 마사 스튜어트 광채 피부 유지 비결은?
-
8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9
라면 먹고도 후회 안 하는 7가지 방법[노화설계]
-
10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1
‘민주 킹메이커’ 이해찬 전 총리 별세…7선 무패-책임 총리까지
-
2
“한동훈에 극형 안돼” “빨리 정리한뒤 지선준비”…갈라진 국힘
-
3
李 “팔때보다 세금 비싸도 들고 버틸까”… 하루 4차례 집값 메시지
-
4
李,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
5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민주당 킹메이커’ 이해찬 별세
-
6
운동권 1세대서 7선 의원-책임총리까지… 민주당 킹메이커
-
7
이혜훈 낙마, 與 입장 전달 전 李가 먼저 결심했다
-
8
탈원전 유턴…李정부, 신규 원전 계획대로 짓는다
-
9
이준석 “한동훈 사과는 일본식 사과, 장동혁 단식은 정치 기술”
-
10
한동훈 제명 두고 국힘 ‘폭풍전야’…장동혁 복귀후 직접 마무리할 듯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빛나는 조연]英배우 주드 로/주연 압도하는 '2色 카리스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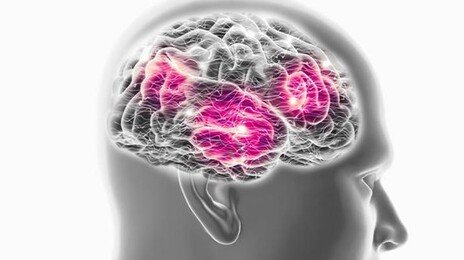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