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하나 교수 진료실 속의 性이야기]<끝>'이불지도' 악몽 지우기
-
입력 2006년 12월 4일 03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선생님, 제 딸이 열 살인데 일주일에 3, 4일은 자다가 이부자리를 적셔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지만 여자아이인 데다가 캠프에 가거나 친척 집에서 자다가 소변을 지릴까봐 걱정이 심합니다. 본인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K 씨의 딸은 낮에는 문제가 없다가 유독 밤에만 소변을 지린다. 이른바 야뇨증이다. 어린이는 물론 과민성방광을 가진 어른에게도 나타나는 이 질환은 당사자들에겐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 야뇨증은 크면서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부모가 무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 야뇨증은 16세가 되면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심히’가 아이들에게는 ‘무진장’ 큰 짐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몸은 밤에 소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한다. 야뇨증은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서 생긴다.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성숙하지 못해 소변을 지리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으로 쓰는 어린이 야뇨증 치료는 저녁에 잠들기 전 수분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과일, 주스,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아이가 잠자기 전에 꼭 소변을 보도록 해야 한다.
잠들고 나서 세 시간 후에 소변을 가장 많이 지리므로 이 시간대에 깨워서 소변을 보도록 훈련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칭찬해 주는 것도 좋다. 설사 소변을 지리더라도 심하게 혼내면 안 된다.
요즘 야뇨증 치료의 추세는 약물 치료다. 야뇨증 발생 원인이 밝혀지면서 이를 조절하는 약물이 많이 개발됐다.
하루 한 번 복용하거나 코로 흡수되는 스프레이 방식의 약이 많이 쓰인다. 야뇨증의 원인이 과민성 방광 문제라면 약물로 치료될 수 있다. 아이가 야뇨증이라면 무심히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다.
윤하나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
-끝-
日 교과서 왜곡 :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 :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절차 >
-

함께 미래 라운지
구독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비즈워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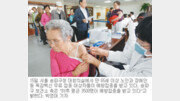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