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676>卷七. 烏江의 슬픈 노래
-
입력 2006년 1월 27일 03시 15분
글자크기 설정

번쾌가 말고삐를 당기며 그렇게 소리쳤으나, 달려온 기세가 있어서인지 한군 선봉은 얼른 멈출 수가 없었다. 놀라고 겁먹은 채로 멈칫멈칫 나아가고 있는데 패왕의 초군이 한 덩이가 되어 덮치고, 한군 선봉은 마치 쇠뭉치에 얻어맞은 흙덩어리처럼 부스러졌다.
얼결에 난군 한가운데 떨어지게 된 번쾌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정신없이 큰 칼을 휘두르며 초군에 맞섰으나 처음부터 어림없는 싸움이었다. 기세가 꺾인 사졸들이 거미 새끼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데다 멀리서는 달아나던 항양의 군사들까지 되돌아서서 덤벼들고 있었다.
“속았다. 모두 물러나라! 본진으로 돌아가 대오를 가다듬고 다시 싸우자.”
번쾌가 그렇게 외치며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나 그런 번쾌를 따라 본진으로 되돌아간 한군은 몇 되지 않았다. 거의가 거세게 치고 드는 초군의 흐름 속에 휩쓸려 죽거나 항복하는 바람에 한군 선봉 5천은 고스란히 사라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패왕이 이끄는 초나라 군사들이 먼저 앞을 가로막는 한군 선봉을 쓸어버리고 나니, 바로 훤한 벌판이 열리고 한왕이 이끄는 10만 대군이 한눈에 들어왔다. 사방이 탁 트여서 그런지 벌겋게 들판을 덮고 있는 한군의 위세가 실제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느껴졌다.
한군이 치고 들어가는 자기들보다 여남은 배는 많아 보이자 어지간한 초나라 군사들도 주춤했다. 그걸 보고 다시 패왕이 범이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강동의 용사들이여, 거록(鉅鹿)을 잊었는가? 거기서 우리는 하루에 아홉 번을 싸워 아홉 번을 이기고 왕리(王離)의 20만 대군을 쳐부수었다. 그때도 우리 군사는 3만을 크게 넘지 않았다!”
패왕이 이끌고 있는 1만은 대개가 강동(江東)의 자제(子弟)들이었다. 셋 가운데 둘은 직접 거록의 싸움을 겪었고, 그 나머지 하나도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 자신이 겪은 싸움처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패왕의 외침은 눈부신 전설을 재현하여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자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갑자기 숙연해져 잠깐이나마 두려움에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다.
멈칫했던 1만 명의 초나라 군사가 다시 한 덩어리가 되어 뛰쳐나갔다. 그렇게 되자, 초군은 앞장서서 말을 달리는 패왕 항우를 첨단(尖端)으로 삼는 거대한 쐐기꼴이 되어 한왕 유방이 이끈 10만 대군 한가운데를 쪼개고 들었다.
멀찍이서 바라보고도 앞장선 패왕을 알아본 한왕 유방은 가슴이 섬뜩했다. 거기다가 믿고 내보낸 번쾌마저 데리고 간 군사 5천을 모두 잃고 기마 여남은 기(騎)에 싸여 쫓겨 들어오는 것을 보자 비로소 장량과 진평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얼른 하후영에게 수레를 멈추게 하고 소리쳤다.
“저 흉악한 도둑이 또 제 죽을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누가 나가서 항우를 잡아오겠느냐?”
당장은 기죽은 꼴을 보이기 싫어 그렇게 큰소리를 쳤으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 패왕에게 당한 갖가지 낭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때마침 수레 주위에 와 있던 주발이 나서서 한왕의 말을 받았다.
“신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월 300만원 줘도 “공무원은 싫어요”…Z세대 82% ‘의향 없다’
-
6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美 이민단속에 예산 펑펑…“32조 떼돈 벌었다” 웃는 기업 어디?
-
9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10
윤주모, 편의점 덮밥 부실 논란 해명…“맛없어 보이게 찍어”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트렌드뉴스
-
1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2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3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4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5
월 300만원 줘도 “공무원은 싫어요”…Z세대 82% ‘의향 없다’
-
6
[동아광장/박용]이혜훈 가족의 엇나간 ‘대한민국 사용설명서’
-
7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
8
美 이민단속에 예산 펑펑…“32조 떼돈 벌었다” 웃는 기업 어디?
-
9
‘사우디 방산 전시회’ 향하던 공군기, 엔진 이상에 日 비상착륙
-
10
윤주모, 편의점 덮밥 부실 논란 해명…“맛없어 보이게 찍어”
-
1
장동혁, 강성 지지층 결집 선택… 오세훈도 나서 “張 물러나라”
-
2
[사설]장동혁, 한동훈 제명… 공멸 아니면 자멸의 길
-
3
오세훈 “장동혁 물러나야” 직격…지방선거 전열 흔들리는 국힘
-
4
李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나”…캄보디아어로도 경고
-
5
“장동혁 재신임 물어야” “모든게 張 책임이냐”…내전 격화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李, ‘로봇 반대’ 현대차 노조 향해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어”
-
8
한동훈 다음 스텝은…➀법적 대응 ➁무소속 출마 ➂신당 창당
-
9
李, 로봇 도입 반대한 현대차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피할수 없다”
-
10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 40%, “잘한다” 26%…李지지율 60%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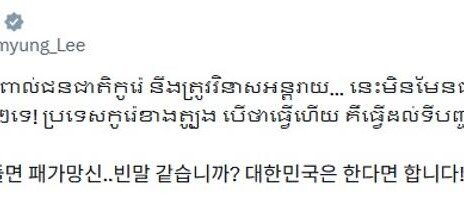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