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소냐 간디의 인도]공기업 민영화정책 거부…주가 폭락
-
입력 2004년 5월 17일 18시 01분
글자크기 설정

▽농업이 동력=인도는 2003년 8.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10∼12월)와 올해 1·4분기(1∼3월)에는 10.4%, 10.8%로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10%의 성장률은 96년 인도 정부가 분기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로 초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높은 성장률이다.
인도의 고성장은 농업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이 남다르다. 인도 농업은 지난해 4·4분기에 16.9% 성장했다. 농업부문은 인도 전체 인구의 66%,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면서 정보통신 위주의 서비스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절반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뿐더러 농민 3억명이 하루 생계비 1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빈 상태에서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것이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전 총리가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난 근본 원인이다.
▽불안심리 가중=소냐 당수가 이끌 내각의 성향은 바지파이 전 총리 때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민영화가 대표적. 국민회의당은 공식적으로는 민영화 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이나 투자자들은 별로 믿지 않는 눈치다.
심지어 하르키샨 싱 수르제트 마르크스주의당 사무총장은 “인도 내각에서 민영화부 장관은 이제 소용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정책들은 해로울 뿐이다”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은 그동안 민영화 1순위로 꼽혔던 힌두스탄석유와 바라트석유에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극빈층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더 늘리겠다는 국민회의당의 정책도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 인도는 외환보유고가 1000억달러(약 119조원)나 되지만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이른다.
뉴델리의 신용평가기관인 크리실의 수비르 고카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영화를 하지 않은 채 극빈층 보조금을 늘린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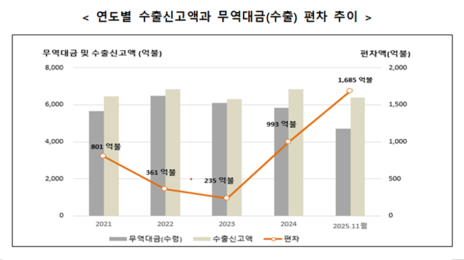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