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中축구리그 정상서 5년만에 국내 복귀한 이장수 감독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9시 09분
글자크기 설정

‘강한 남자’ 이장수씨(47·사진)가 돌아왔다. 1998년 일화축구팀 감독 자리를 내던지고 중국으로 떠난 지 5년 만이다.
16일 프로축구단 전남 드래곤즈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통하더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가 연달아 중국을 들먹인 이유는 독특한 축구문화 때문. 한두 경기 성적만 부진해도 당장 감독 목이 잘리는 곳이 중국이다. 그래서 ‘감독들의 무덤’으로 불린다.
이런 살벌한 판에서 이 감독은 살아남았다. 중국으로 간 첫해 2부 리그 탈락 위기에 처한 충칭 리판을 맡아 이듬해 정규리그 4위로 도약시킨 뒤 2000년엔 중국축구협회(FA)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1년엔 연봉 6억원의 특A급 대우를 받으며 칭다오 이중팀으로 옮겨 이듬해 다시 FA컵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지도자 가운데 한 명. 중국 언론은 그를 ‘강한 남자’로 부른다. 5년 동안 두 차례나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으니 그럴 수밖에…. 그러나 정작 중국인들이 이 감독을 좋아한 이유는 그의 의리 때문이라고. 숱한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며 팀과 선수들을 지킨 게 중국팬들을 감동시켰던 것.
중국축구엔 뿌리 깊은 공한증(恐韓症)이 있다.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이기지 못한 까닭을 그는 어떻게 볼까.
“중국축구의 실력이 뒤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큽니다. 지금 중국은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5, 6년 뒤엔 한국과 대등한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봅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 감독은 영남상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대우와 유공에서 선수로 뛰었고 일화 코치와 감독(97년)을 역임했다.
김상호기자 hyangsan@donga.com
트렌드뉴스
-
1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2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
5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6
李,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
7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8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9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10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6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트렌드뉴스
-
1
블랙핑크, ‘레드 다이아’ 버튼 받았다…세계 아티스트 최초
-
2
국토장관 “60억 아파트 50억으로…주택시장, 이성 되찾아”
-
3
전원주 “벌써 자식들이 재산 노려…인감도장 달래”
-
4
美, 관세 만능키 ‘슈퍼 301조’ 꺼냈다…“주요 교역국 조사 착수”
-
5
당뇨병 환자도 7월부터 장애 인정 받는다
-
6
李,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
7
“D램 품귀에 공장 100% 돌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추가 증설 나서”
-
8
“스페이스X 기대감에 200% 급등”…블룸버그, 한국 증권주 ‘우회 투자’ 부각
-
9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10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1
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
2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
3
국힘 내부 ‘장동혁 사퇴론’ 부글부글…오세훈 독자 행보 시사도
-
4
유시민 “李공소취소 모임, 미친 짓”에 친명계 “선 넘지마라”
-
5
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
6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
7
尹 ‘입틀막’ 카이스트서…李, 졸업생과 하이파이브-셀카
-
8
[사설]범보수마저 경악하게 한 張… ‘尹 절연’ 아닌 ‘당 절단’ 노리나
-
9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
10
트럼프, 세계에 10% 관세 때렸다…24일 발효, 승용차는 제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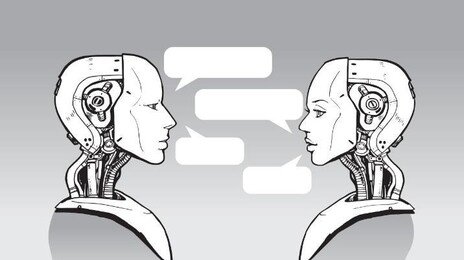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