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가꾼 ‘바다 정원’에서 새해를 만나다[김선미의 시크릿가든]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북 감포·구룡포·호미곶 지질기행

“겨울에는 경북 동해안 ‘바다 정원’에 와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무렵 만난 경상북도 분들이 바다 정원 얘기를 꺼냈다. 지난해 4월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일원의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에서부터 포항 호미곶까지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1박 2일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금강산도 식후경. 경주역에서 차를 타고 경주 건천읍 ‘모량칼국수’에 가서 칼국수를 먹었다. 푹 우려낸 구수한 육수가 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직접 삶은 우리 콩으로 새벽에 만든다는 촌두부도 담백했다.
한 시간쯤 달리자 양남 주상절리 전망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불국사와 보문단지, 황리단길로 유명한 천년고도 경주에는 바다도 있다. 전망대 바로 앞에 꽃잎처럼 펼쳐진 부채꼴 주상절리가 있었다. 화산활동으로 분출한 섭씨 1000도 이상의 용암이 식으며 형성된 주상절리는 식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달라진다. 천연기념물 제536호인 양남 주상절리군은 부채꼴뿐 아니라 위로 솟은 형과 기울어진 형, 누운 형 등 신비로운 형태가 여럿 있다. 2700만 년 전 신생대 제3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지질의 시간 앞에서 숙연해졌다.


● 등대와 항구를 따라서
10분을 더 달리니 감포였다. 감포는 경북의 일상을 품는 항구다. 지난해 경주에 왔을 때 감포 ‘남해식당’에서 가자미구이와 조림을 푸짐하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났다. 이번엔 1961년부터 4대에 걸쳐 50년 넘게 국내산 생멸치로 멸치액젓을 생산하는 ‘김명수 젓갈’에 들렀다. ‘갈치 뻑뻑이 앳젓’으로 유명한 김명수 젓갈의 김헌목 대표는 지역사회 기부에 앞장서 지난해 경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감포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 냄새다.
근처 해송 군락지에는 송대말등대가 있었다.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송대말·松臺末)이라는 뜻도 예쁜데, 감은사지 삼층석탑을 형상화한 한옥 형태는 더 예뻤다. 2022년 새롭게 정비된 이 등대는 경주 바다와 감포항, 등대 이야기를 미디어아트 기반의 체험 전시로 선보이고 있었다. 바다 쪽으로 몸을 낮춘 듯 단아하게 선 등대를 보면서 생각했다. 등대는 바다뿐 아니라 육지인의 마음도 비추는 것 같다고.

다시 30분쯤 북상하니 포항 구룡포였다. 구룡포 해수욕장 갈매기들이 화사한 겨울 햇살을 받아 평화로워 보였다. 저기 아장아장 걷는 어린 갈매기는 엄마로부터 은빛 날개짓을 배우는 걸까. 갈매기는 이별 노래에 자주 등장하지만 실은 의리가 넘치는 새라고 한다. 동료가 다치면 달아나지 않고 곁을 지켜 죽음을 뛰어넘는 우정과 사랑을 보여준다. 백사장 모래가 하도 곱기에 구부려 앉아 손가락으로 커다란 하트를 그려 보았다. 이내 파도가 와서 지울지라도 구룡포에 마음을 남겨 두고 싶었다.



● 호미곶이 준 새해 희망
한반도 동쪽 땅끝 호미곶에서 해돋이를 기다렸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이 연한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호미곶의 상징인 ‘상생의 손’ 조형물 위에 갈매기가 내려앉았다. 그곳이 삶의 터전인 듯 서두르는 기색 없는 몸짓이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아기 얼굴처럼 떠오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누군가는 상생의 손이 해를 구슬처럼 잡은 것처럼 구도를 잡아 사진을 찍었다. 동행자가 말했다. “두 팔 벌려 새해의 기운을 받아 봅시다.” 두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리니 정말로 해의 우렁찬 기운이 온몸을 적시는 기분이었다.

호미곶에 해녀들이 나타났다. 고무 작업복을 입고 테왁(물질할 때 부력을 얻는 도구)을 든 해녀들이 일을 나서는 길이었다. 경북 어촌계장 147명 중 유일한 해녀 출신인 성정희 경북해녀협회장이 함께 나와 물었다. “해녀들이 물질하는 곳에 같이 가 보시겠어요?” 60, 70대 해녀들이 오리발을 끼고 바다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26년 전 제주 해녀를 취재했던 때를 떠올렸다. 해녀가 향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 때였다. 지금은 아니다. 2016년 제주 해녀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해녀들의 자긍심이 몰라보게 높아졌다. 말똥성게처럼 값비싼 해산물을 채취해 손주들의 해외 어학연수비를 대주는 걸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경제적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근심, 걱정을 내려놓는 ‘바다 정원’이다. 어촌 마을에는 소라 껍데기로 꾸민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호미곶면 구만리에는 작은 문학관이 있었다. 수필문학가 고 한흑구(1909~1979)의 문학과 삶을 기리는 ‘흑구 문학관’이다. 그가 1955년 동아일보에 처음 발표한 수필 ‘보리’는 1960~1970년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며 사랑받았다. 나무, 산, 새 등을 맑게 쓴 그의 글에 이끌려 서울로 돌아와 범우문고 수필집 ‘보리’를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닌다. 이 책에는 수필 ‘동해산문(東海散文)’도 있다. ‘나는 늘 바다를 바라본다. 무한한 창공과 맞대어 있는 저 수평선 너머로 언제나 나의 사색은 물결처럼 쉬임없이 흘러 넘쳐간다. 광막한 바다여! 너의 크고, 넓고, 또한 황량한 것이 나는 좋다.’

경주역으로 가는 길에는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1코스를 둘러봤다. 해병대 상륙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백사장을 걷다가 시인 이육사 조형물을 만났다. 시인은 휴양차 포항에 머물던 1936년 청림동 청포도 농장을 바라보며 ‘청포도’ 시를 구상했다고 한다. 인근 ‘촌놈물회’의 시원한 물회 한 그릇이 여행을 청량하게 마무리해 줬다.

지질의 거대한 시간 위에 삶과 문학이 겹겹이 포개졌다. 감포에서 구룡포를 지나 호미곶에 이르는 바다는 크고 넓고 따뜻했다. 살다가 힘들면 상생의 손 끝에 걸리던 뜨거운 해의 기운과 미역 바위의 평화를 떠올리겠다.

김선미의 시크릿가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리
구독
-

황재성의 황금알
구독
-

전승훈의 아트로드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속보]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의원
-
5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6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7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8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9
與서울시장,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정원오 6인 경선
-
10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8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9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트렌드뉴스
-
1
드론 수백대 줄지어…이란, 무기 터널 공개 ‘전쟁 능력’ 과시
-
2
“합격, 연봉1억2000만원” 4분 뒤 “채용 취소합니다”…法, 부당 해고 판결
-
3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4
[속보]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의원
-
5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6
엇갈리는 미군 사상자…美 “3명 전사” vs 이란 “560명 죽거나 다쳐”
-
7
“귀 안까지 찌릿”…뒤통수 통증 부르는 이 질환은?
-
8
한국이 제빵 강국이 된 비결
-
9
與서울시장,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정원오 6인 경선
-
10
싱가포르, 난초 교배종에 ‘이재명-김혜경 난’ 이름 붙여
-
1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
2
‘까불면 다친다’ 또 목격한 김정은… 核보유 더 집착 가능성
-
3
北 “이란 공격은 후안무치 불량배적 행태…용납 못 해” 美-이스라엘 비난
-
4
[김승련 칼럼]장동혁-한동훈, 알고 보면 운명공동체
-
5
李 “집 팔기 싫다면 두라, 이익-손실 정부가 정해”
-
6
175일만에 만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악수만 했다
-
7
검은 먹구름 뒤 ‘번쩍’, 땅이 무너졌다…이스라엘군, 공습 영상 공개
-
8
장동혁 “오피스텔, 보러도 안 와”…정청래 “부럽다, 난 0주택”
-
9
“과거사 사죄는 평생의 사명” 日목사…“日 정부와 국민은 달라요”
-
10
李대통령 “국민 여러분 전혀 걱정 않으셔도…일상 즐기시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지구가 가꾼 ‘바다 정원’에서 새해를 만나다[김선미의 시크릿가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16/133172917.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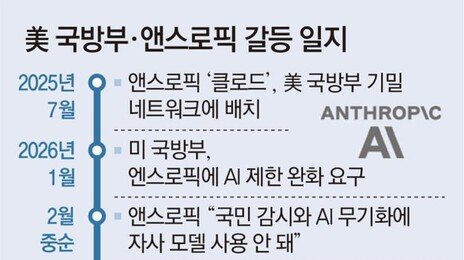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