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집값이 출산 가로막고, 사교육비가 둘째 못낳게 한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구에서 인간으로/이철희 지음/416쪽·2만3000원·위즈덤하우스

세계적 인구학자이자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지난해 11월 한국의 한 포럼에 참석해 “한국이 인구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세계 최초로 인구 소멸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도 같은 시기 엑스(X·옛 트위터)에 “세대마다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붕괴”란 게시물을 올렸다.
그동안 한국의 저출산 담론은 오랫동안 ‘숫자’의 언어에 갇혀 있었다.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인구 피라미드 같은 지표로 문제의 심각함을 주로 논의했다. 신간은 이 익숙한 논의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든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30년 넘게 인구경제학을 연구해 온 저자는 “왜 이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점점 어려운 선택이 됐는가”를 묻는다.
책은 여성 인구 구조와 결혼 감소, 유배우(有配偶) 출산율 변화를 꼼꼼히 살피며 한국 저출산의 핵심 요인이 ‘결혼의 감소’와 ‘첫째 아이 출산의 급락’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사교육비, 주거비, 노동시장 불안정, 성평등 수준 같은 경제·사회적 요인을 결합해 출산 결정이 개인의 의지나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임을 논증한다.
다만 저출산 정책 평가에서 지나친 단정은 피한다. “지난 20년의 정책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결혼한 중상위층 가구에 편중돼 정책의 영향권 밖에 놓인 사람이 지나치게 많았다”고 짚는다. 또 비혼 출산 지원 역시 출산율 제고 수단이 아니라 인권과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풀어간다.
책의 결론은 명확하다. 출산율 자체를 목표로 삼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년의 현재를 힘들게 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조건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아이를 ‘인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대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없다면, 어떤 숫자도 회복되지 않는다. 인구 위기를 둘러싼 다소 감정적인 논쟁을 넘어, 정책과 사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준다.
책의 향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광장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이준일의 세상을 바꾼 금융인들
구독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3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4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7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3
마약밀수 총책 잡았더니,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다
-
4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5
3선 도전 불가능한데…트럼프, 정치자금 5400억 원 모았다
-
6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9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10
1983년 이후 최대 폭락…워시 쇼크에 오천피 붕괴-亞 ‘블랙 먼데이’
-
1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3
집값 잡기 이번엔 다르다는 李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
4
[김승련 칼럼]‘한동훈 배신자’ 논란, 뜨겁게 붙으라
-
5
국힘 “李, 호통 정치에 푹 빠진듯…분당 똘똘한 한채부터 팔라”
-
6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7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8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이언주, 정청래 면전서 “2,3인자가 대권욕망 표출…민주당 주류교체 시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밑줄 긋기]슬픔이 서툰 사람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6/01/30/133266989.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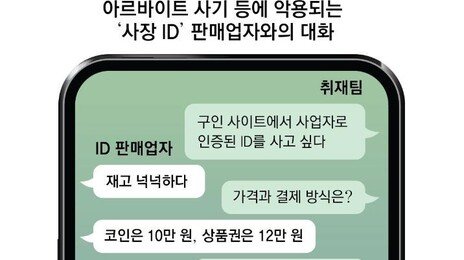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