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선비들, 물건에 마음을 건네다
- 동아일보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조상들이 물건에 새긴 글 주목한 ‘명, 사물에 새긴 선비의 마음’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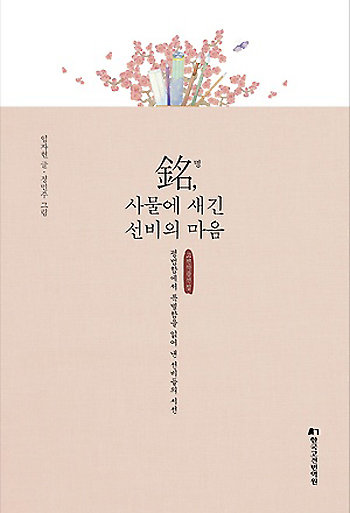
‘귀한 예복도 네가 간직하고 허름한 도롱이도 네가 간직하지. 말끔한 옷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남루한 옷이라고 싫어하지도 않는다네’(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중)
옷장은 누구나 매일 보는 사물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에겐 색다른 시선이 느껴진다. 어떤 옷이든 넉넉하고, 공평하게 받아들이는 옷장의 모습을 이같이 표현한 것.
정조 때 재상을 지낸 채제공(1720∼1799)은 ‘붓’의 역할에 주목했다. ‘너를 잘 사용하면 천인성명과 같은 심원한 이치 모두 묘사할 수 있지/너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충의와 사악, 흑과 백 같은 양극단 모두 뒤바뀌고도 남지’(번암집·樊巖集 중)
한국고전번역원 전문위원으로 일했던 임자헌 씨가 글을 썼고, 정민주 씨가 그림을 그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이혜훈 “비망록 내가 쓴것 아냐…누군가 짐작·소문 버무린 것”
-
6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트렌드뉴스
-
1
하버드 의사가 실천하는 ‘뇌 노화 늦추는 6가지 습관’ [노화설계]
-
2
“내가 불륜 피해자”…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
3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4
폐암 말기 환자가 40년 더 살았다…‘기적의 섬’ 어디?
-
5
이혜훈 “비망록 내가 쓴것 아냐…누군가 짐작·소문 버무린 것”
-
6
압수한 비트코인 분실한 檢… 수백억대 추정
-
7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8
‘소득 있는 노인’ 노령연금 감액 안한다…월 519만원 미만 대상
-
9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10
[단독]年수출 처음 일본 제치나…현 환율로 韓 135억 달러 많아
-
1
수도권급 간-담도-췌장 수술 역량으로 지방 의료 살린다
-
2
현대차 노조 “합의 없인 로봇 단 1대도 안돼”…‘아틀라스’에 위기감
-
3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더 큰 싸움 위해 단식 중단”
-
4
한동훈 제명 결정, 민주-국힘 지지층 모두 “잘했다” 더 많아
-
5
장동혁 양지병원 입원…“단식 8일간 靑·여당 아무도 안왔다”
-
6
[단독]이혜훈 “장남 다자녀 전형 입학” 허위 논란
-
7
민주, 조국당 3∼7% 지지율 흡수해 서울-부산-충청 싹쓸이 노려
-
8
“육해공사 통합, 국군사관대학교 신설” 국방부에 권고
-
9
법원 “이진숙 방통위 KBS 이사 7명 임명 무효”
-
10
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쾌유 기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