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학예술]‘히말라야, 40일간의 낮과 밤’
-
입력 2006년 10월 14일 03시 03분
글자크기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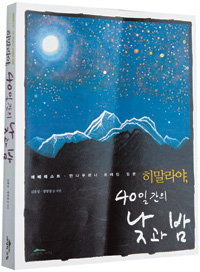
푸른 룽다 펄럭이는 날/내 마음도 나부끼네/하늘 높이 새들은 날고/흰 구름은 흘러가네.//사랑하는 나의 여인아/잠시 나를 보내주오/순한 미소 지으면서/나의 배낭 꾸려주오//기다리는 그대가 있어/돌아오는 나도 있네/푸른 룽다 펄럭이는 날/바람처럼 돌아오네.(푸른 룽다)
룽다는 히말라야 지역 소수민족들이 불경을 새겨 나무나 돌에 거는 깃발이다. 고난의 순례자들이 지쳐 쓰러질 무렵 룽다를 만나 불심(佛心)을 얻고 기력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기도처다.
저자인 시인 김홍성 씨와 부인 정명경 씨에게 히말라야는 바로 룽다다. 세속에 뼛속 깊이 물든 인간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다 찢긴 심신을 안고 찾아들어가는 고향집이자 어머니다. ‘푸른 룽다’는 ‘The water is wide’란 곡에 김홍성 시인이 가사를 붙이고 부인 정 씨가 즐겨 불렀던 노래다.
이 책은 초모룽마(에베레스트 산)의 남쪽 기슭 쿰부 지역과 ‘하얀 쌀밥이 쟁반에 가득 쌓인 모양’을 뜻하는 안나푸르나 지역에 대한 순례(트레킹)의 기록이다.
10여 년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소풍’이라는 한식당을 경영하며 히말라야를 순례해 온 부부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시원(始原)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부부의 눈에는 히말라야가 ‘좌선하고 있는 거인족의 고승인 듯, 혹은 삼매에 빠져든 신들의 모습인 듯’ 비친다. ‘해발 5000m 가까이 가서 며칠 지내 보면 문득 저승 문지방을 밟는 느낌’이란다. 밥맛이 돈다든지, 꽃과 소녀들이 어여쁘게 보이고, 미워해야 마땅한 어떤 인간도 그냥 가련하게 보인다.
부인 정 씨는 7월 초 간암으로 세상을 떴다. 20년 전 시인 고은의 추천으로 등단했던 김홍성 시인이 처음으로 시집 ‘나팔꽃 피는 창가에서’를 낸 것은 아내가 죽기 3일 전이었다.
‘그녀는 없다. 한줄기 연기로 변해, 우리 곁을 떠나는 현장에 있었으므로, 나는 그 사실을 잘 안다. 어디선가 그녀의 밝은 웃음이, 그녀에게 잘 어울렸던 푸른 룽다 노랫소리가 이명처럼 들려왔다.’(소설가 신영철의 추천사에서)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문학예술 >
-

이준일의 세상을 바꾼 금융인들
구독
-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구독
-

e글e글
구독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6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7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8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9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10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6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트렌드뉴스
-
1
‘서울대’ 이부진 아들 “3년간 스마트폰-게임과 단절하라” 공부법 강의
-
2
“중국 귀화해 메달 39개 바칠때 ‘먹튀’ 비난한 당신들은 뭘 했나”
-
3
“돈 좀 썼어” 성과급 1억 SK하이닉스 직원 ‘반전 자랑 글’
-
4
“유심칩 녹여 금 191g 얻었다”…온라인 달군 ‘현대판 연금술’
-
5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6
V리그 역사에 이번 시즌 박정아보다 나쁜 공격수는 없었다 [발리볼 비키니]
-
7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8
‘마약밀수 총책’ 잡고보니 前 프로야구 선수
-
9
담배 피우며 배추 절이다 침까지….분노 부른 中공장 결국
-
10
“얘기 하자하니 ‘감히 의원에게’ 반말” vs “먼저 ‘야 인마’ 도발”
-
1
李 “다주택자 눈물? 마귀에 양심 뺏겼나…청년은 피눈물”
-
2
[단독] “앞니 3개 부러지고 피범벅” 韓관광객 日서 집단폭행 당해
-
3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에 지선 패할까 속이 숯검댕이”
-
4
“야 인마” “나왔다. 어쩔래”…‘韓 제명’ 국힘, 의총서 삿대질
-
5
코스피, 장중 5000선 깨졌다…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
6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SNS 글 삭제
-
7
장동혁, 친한계 반발에 “수사결과 韓징계 잘못땐 책임지겠다”
-
8
與 ‘5+1’ 서울시장 출마 러시… 국힘은 ‘강성 당원’ 변수
-
9
장동혁 “‘한동훈 징계 잘못’ 수사로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지겠다”
-
10
靑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