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화칼럼/이학준]미술시장 숨통 틔우기
-
입력 2004년 12월 17일 17시 37분
글자크기 설정

여기엔 경제 상황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장기 불황의 씨앗은 이미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건국 이래 최대 호황기라고 하던 때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일부 인기작가의 작품 가격이 급등하자 투기적 소장가들이 가세했고 일부 미술품 유통 관계자들이 작품 가격 폭등을 부추겼던 것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순수한 미술애호가들은 상처를 받고 미술시장을 영영 떠나 버렸다. 시장의 신뢰 상실, 이것이 우리 미술계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 한국 미술시장의 미래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한국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소더비, 크리스티 등 유명 경매회사를 통해 국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려 나가 오히려 시장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현대미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부터 홍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국적의 소장가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작가들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국제성을 확보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작가뿐만 아니라 소장가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장기 불황을 통해 투기세력은 거의 시장에서 퇴출됐다. 경험 많은 애호가 그룹과 새로운 감각의 신진 소장가 그룹은 어려운 미술시장을 지탱해 주는 근간이 되고 있다.
미술품의 특성상 귀한 작품은 고가에 거래되기 마련이다. 국내 경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7억 원에 낙찰된 겸재 정선의 작품이다. 올 5월 소더비 경매에서는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에 거래된 피카소 작품이 나왔다. 물론 미술시장의 환경과 규모가 다른 마당에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괴리는 너무 크다.
귀하고 좋은 작품이 제대로 된 가격에 양성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한국 미술시장과 미술계 전체에 미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작품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귀한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우리문화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미술품 거래를 바라보는 더 성숙된 국민의식이 절실할 때다.
전업작가 1500명 가운데 1년 평균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작가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한국 작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노력의 결과다. 그와 함께 여러가지 오해에도 불구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는 미술품 수집에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 주는 소장가들을 보면 간송이나 호암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좋은 소장가는 좋은 작가와 같다’는 말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저만큼 터널 끝에 햇살이 보인다. 오랜 추위 끝에 돋아나는 새싹을 함께 소중히 키워 나갈 일만 남았다.
이학준 서울옥션 상무
문화 칼럼 >
-

김도언의 너희가 노포를 아느냐
구독
-

사설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8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9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10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트렌드뉴스
-
1
오늘 밤 서울 최대 10㎝ 눈폭탄…월요일 출근길 비상
-
2
혹한 속 태어난 송아지 집에 들였더니…세살배기 아들과 낮잠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5
60조 캐나다 잠수함 입찰 앞둔 한화, 현지에 대대적 거리 광고
-
6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7
0.24초의 기적…올림픽 직전 월드컵 우승 따낸 ‘배추 보이’ 이상호
-
8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9
美 군사작전 임박?…감시 항공기 ‘포세이돈’ 이란 인근서 관측
-
10
한국인의 빵 사랑, 100년 전 광장시장에서 시작됐다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李 “유치원생처럼 못 알아들어”…부동산 비판한 국힘에 한밤 반박
-
3
한병도 “한동훈 토크콘서트는 ‘티켓 장사’”…韓 “1원도 안 가져가”
-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5
오세훈 “세운지구·태릉CC 이중잣대, 대통령이 정리해 달라”
-
6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7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8
귀국한 김정관 “美측과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해”
-
9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10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문화칼럼/성완경]문화는 넘치는데 예술은 없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1/03/693688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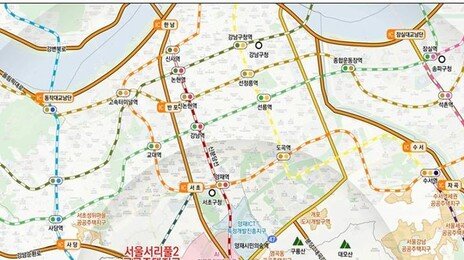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