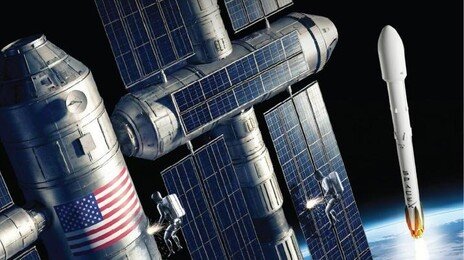공유하기
분단문학 대표작가 김원일 이산상봉 동행기
-
입력 2002년 5월 1일 18시 27분
글자크기 설정

“마음이 좋지 않지요. 돌아오는 배를 타는 그 순간까지도 소식을 알게 되길 기다렸는데…. 내내 대기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76년 원산 부근의 서광사 요양원에서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98년에 건너건너 전해 들었지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나 했는데….”
부친 김종표씨는 남조선노동당 간부를 지내다 50년 9월 가족을 남기고 단신 월북했다. 월북한 아버지와 결혼한 또 다른 어머니, 두 동생과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원요원 자격인데다 북한 당국과의 협의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만나면 주려고 준비한 여름옷과 내의 몇 벌, 시계를 담았던 가방도 그대로 김씨와 함께 돌아왔다.
“금강산에 있는 동안 한번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날 서로 헤어지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에요. 핏줄 간의 만남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일렁이는 심경을 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번졌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빨갱이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어린 시절과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마음대로 불러 보지조차 못하는 남측의 ‘월북자 가족’ 등 여러 생각이 엉켜 드는 듯 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월북자 가족이 마음 편히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지요. 내가 상봉단에 속해 방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월북자 가족으로서는 첫 케이스니까요. 내 가족을 못 만난 것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는 떨어져 살던 가족들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50여 년이라는 긴 시간,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크게 벌어진 남북의 간극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남북의 가족이 처음 만나 눈물을 흘리고 안부를 확인한 뒤에는 멍하게 앉아있거나 생각의 차이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혈연과 정감으로 기억해 내는, 헤어질 당시의 얘기에 그칠 뿐이에요. 분단의 이질화가 심각하더군요.”
김씨는 이러한 상봉 행사는 하나의 ‘전시’에 불과하다며 우선 상호 편지 교환을 통해 생사 여부,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방북자 선정에 있어 현재의 추첨식보다는 연령과 직계가족 생존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과 분단,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픔을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지 물었다.
“TV에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봤을 거예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윗세대가 겪은 아픔이라는 것을, 그 아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이 가진 특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뼈 아픈 가난, 유약한 자아, 냉소적인 사회 때문에 ‘삶은 악마’라고 여겼다는 그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 새로 생긴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문학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생각했다 한다.
“어쩌면 문학이, 우리 동네에 방범등을 설치해 주는 구청장보다 못할지도 모르죠. 그저 얘기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분단과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 더 이상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북한이 지금처럼 낙후된 채로 굶주림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떤 체제도 서로 다치지 않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9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10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트렌드뉴스
-
1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2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
3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
4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
5
“폭설 속 96시간” 히말라야서 숨진 주인 지킨 핏불
-
6
트럼프 “내가 너무 친절했다…관세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으름장
-
7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8
“뱀이다” 강남 지하철 화장실서 화들짝…멸종위기 ‘볼파이톤’
-
9
이란 남부 항구도시 8층 건물서 폭발…“원인 불명”
-
10
김현철, 동심 나눈 박명수-클래식이 붙어… 그가 투명한 감정 고집하는 이유는? [유재영의 전국깐부자랑]
-
1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
2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
6
“실패해보지 않으면 위험한 인생” 李대통령의 ‘창업론’
-
7
지하철이 식당인가…컵라면, 도시락에 캔맥주까지
-
8
韓 “입법전 투자 협의” 美 “빨리 시간표 달라”
-
9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
10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AGAIN’ 만들고 인증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