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 향기]땅속에 버린 것들, 언젠가는 우릴 덮칠지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8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언더랜드/로버트 맥팔레인 지음·조은영 옮김/520쪽·2만8000원·소소의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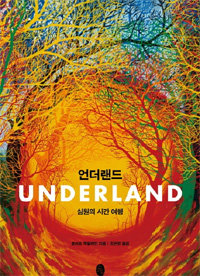
영국 저술가인 저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땅 밑 세상을 파헤친다. 자연을 소재로 한 책으로 데뷔할 때부터 주목받은 그는 자연 풍경과 인간의 마음을 글로 엮었다. 전작인 ‘마음의 산’(2003년), ‘야생의 장소들’(2007년), ‘더 올드 웨이즈’(2012년)가 산과 들판, 오래된 길을 다녔다면 이번엔 더 깊고 축축한 공간으로 파고 들어간 셈이다.
땅 밑에는 인류가 ‘두렵기에 버리고 싶고, 사랑하기에 지키고 싶은 것들’이 들어 있다. 소중한 물건을 간직한 타임캡슐이나 사랑했던 가족, 혹은 두꺼운 벽으로 둘러싼 핵폐기물이 그렇다. 이들은 지상세계에서 보이지 않을 뿐 언젠가는 돌아온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며 질소가 퍼져 나와 뒷덜미를 잡듯이 말이다.
암흑물질의 하나인 윔프 1조 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간, 두개골, 창자를 통과한다. 지구의 맨틀 같은 고체의 원자를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가로지르는 이들 윔프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주 얇은 그물조직, 비단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차단된 땅속에서 연구자들은 암흑물질의 흔적을 뒤쫓는다. 이렇게 지상과는 다른 템포로 흐르는 땅속 ‘심원의 시간’으로 저자는 독자를 초대한다.
심원의 시간 앞에서 인류는 겸허해진다. 숲에서 경쟁하듯 자라는 나무들은 사실 땅속에서 뿌리와 곰팡이의 네트워크로 교류하고 있다. 병에 걸린 나무가 주변 나무의 면역 체계를 깨우고, 영양분이 많은 나무가 그것을 나눠주기도 한다. 파리의 카타콤, 이탈리아 북동부 ‘포이베 대학살’로 시신 수천 구가 가득한 카르스트 동굴로 이야기는 이어진다.
심원의 시공간을 따라가면 일상은 완전히 뒤집힌다. 땅속에 묻힌 억겁의 세월 앞에 하루 일과부터 우리가 집착하는 욕망까지 돌아보게 된다. 마치 산 위에 올라 도시를 바라볼 때 감상에 젖듯.
모든 것을 걷어내고 땅의 묵묵한 시간도 파헤쳐진다면 인류가 남기는 흔적이란 과연 무엇일까. 인류세(世)로 시작한 책은 핀란드 남서부 올킬루오토섬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봉인하는 현장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독자에게 묻는다. ‘땅속에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트렌드뉴스
-
1
장동혁, 오늘 靑오찬 전격 불참…‘법사위 단독처리’ 등 항의
-
2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코스닥 퇴출 늘어난다
-
3
“김건희 입니다…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 주시는 분들” 옥중편지
-
4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與 강행처리에 반기
-
5
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 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
6
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사망할 줄 몰랐다”
-
7
민희진, 하이브서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1심 승소
-
8
‘♥한영’ 박군, 땡잡았다
-
9
日홋카이도 해수욕장서 모래 파묻힌 한국인 시신 발견
-
10
LG家 상속소송, 구광모 승소…故구본무 아내·딸 청구 기각
-
1
장동혁, 오늘 靑오찬 전격 불참…‘법사위 단독처리’ 등 항의
-
2
[김순덕 칼럼]이재명 대통령은 격노하지 않았다
-
3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與 강행처리에 반기
-
4
장동혁 “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하는데 응할 수 없어”
-
5
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 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
6
[사설]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
-
7
김종혁 “장동혁은 전한길-고성국의 숙주…윤어게인, 張 통해 목소리내”[정치를 부탁해]
-
8
‘李대통령 지지’ 이원종도 떨어졌다…콘진원장 후보 5명 전원탈락
-
9
“김건희 입니다…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 주시는 분들” 옥중편지
-
10
[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
트렌드뉴스
-
1
장동혁, 오늘 靑오찬 전격 불참…‘법사위 단독처리’ 등 항의
-
2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코스닥 퇴출 늘어난다
-
3
“김건희 입니다…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 주시는 분들” 옥중편지
-
4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與 강행처리에 반기
-
5
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 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
6
모텔 남성 연쇄살해 혐의 20대女 “사망할 줄 몰랐다”
-
7
민희진, 하이브서 255억 받는다…‘풋옵션 소송’ 1심 승소
-
8
‘♥한영’ 박군, 땡잡았다
-
9
日홋카이도 해수욕장서 모래 파묻힌 한국인 시신 발견
-
10
LG家 상속소송, 구광모 승소…故구본무 아내·딸 청구 기각
-
1
장동혁, 오늘 靑오찬 전격 불참…‘법사위 단독처리’ 등 항의
-
2
[김순덕 칼럼]이재명 대통령은 격노하지 않았다
-
3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與 강행처리에 반기
-
4
장동혁 “등 뒤에 칼 숨기고 악수 청하는데 응할 수 없어”
-
5
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 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
6
[사설]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
-
7
김종혁 “장동혁은 전한길-고성국의 숙주…윤어게인, 張 통해 목소리내”[정치를 부탁해]
-
8
‘李대통령 지지’ 이원종도 떨어졌다…콘진원장 후보 5명 전원탈락
-
9
“김건희 입니다…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 주시는 분들” 옥중편지
-
10
[단독]국방부 “주택공급 위해 국방硏 이전 반대…정부 일방발표”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