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진우 칼럼]‘도로 한나라당’
-
입력 2006년 7월 22일 02시 57분
글자크기 설정

강재섭 대표는 서울지검 검사였던 1983년 대통령비서관으로 발탁돼 5공에 참여했다. 그는 5, 6공 시절 실력자였던 박철언 전 의원의 사(私)조직 ‘월계수회’의 2인자란 소리를 들었다. 그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공천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육사(25기) 출신인 강창희 최고위원은 1980년 민정당 창당 발기인이었고, 정형근 최고위원은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 이후 12년간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은 ‘공안검사’ 출신이다.
이쯤 되면 ‘도로 민정당’이란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3∼5선(選)의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인물들이다. 따라서 ‘도로 민정당’은 퇴영적(退영的) 인물평에 따른 가십은 될지언정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보름 전의 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이명현 교수는 “한나라당이 결국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혹시 운이 좋아서 집권한다면 정말 형편없는 정부가 되겠죠. 아마 지금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엉터리일 겁니다. 나라엔 희망도 없고…”라고 답했다.
5·31지방선거 이전의 한나라당과 이후 한나라당은 달라져야 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정부 여당이 싫어서 표를 몰아줬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압승은 한나라당이 멀게는 민정당의 업보(業報)로부터, 가깝게는 ‘영남당’ ‘수구(守舊)당’ ‘웰빙당’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代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첫 무대가 전당대회였다.
그러나 당 대표 경선은 공공연한 박근혜-이명박의 대리전(代理戰)으로 치러졌다. 당을 어떻게 바꿔내겠다는 소리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삿대질을 해댔을 뿐이다.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黨心)에서는 졌다는 패자(敗者)는 훌쩍 사찰(寺刹)로 떠나 “이런 정체성으로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대리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도로 민정당’이 아니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도로 한나라당’에 있다. 그들은 국민이 믿고 기댈 데 없어 그나마 밀어줬더니 집안싸움이나 하며, 마치 다음 대권이 다 된 밥인 양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듯한 구태(舊態)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앞의 이 교수 말대로라면 나라의 미래를 이런 정당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국민이 지금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만신창이(滿身瘡痍)로 만든 무능한 좌파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합리적 우파세력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북의 기만적인 민족공조 구호에 휘둘려 파탄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동산과 세금, 교육 문제 등 널려 있는 국가 현안에 대해서도 각론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강 신임대표는 ‘참정치실천운동본부’를 만들어 당의 변화와 개혁을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당의 대주주(大株主)인 대선 예비주자들은 더는 커튼 뒤에 숨어 대리전을 지휘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보수야당의 정체성 내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경쟁의 과정 자체가 당의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홀로 민심탐방이나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민심을 당의 변화로 연계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장 변해야 한다. ‘도로 한나라당’에는 내일이 없다. 한나라당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나라가 딱해서이다.
전진우 大記者 youngji@donga.com
오늘과 내일 : 전진우 >
-

사설
구독
-

알파고 쇼크 10년, AI와 인간 공존 실험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트렌드뉴스
-
1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2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3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4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5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6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7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8
달걀, 조리법 따라 영양 달라진다…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
9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10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4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트렌드뉴스
-
1
세계 최초 이란 ‘드론 항모’, 알고보니 한국산?
-
2
“나는 절대 안 먹는다”…심장 전문의가 끊은 음식 3가지
-
3
배우 이상아 애견카페에 경찰 출동…“법 개정에 예견된 일”
-
4
‘K패트리엇’ 천궁-Ⅱ, 이란 미사일 잡았다…UAE서 첫 실전 투입
-
5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6
병걸리자 부모가 산에 버린 딸, ‘연 500억 매출’ 오너 됐다
-
7
이란, 이스라엘에 장거리 미사일 ‘가드르’, ‘에마드’ 발사
-
8
달걀, 조리법 따라 영양 달라진다…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
9
살아서 3년, 죽어서 570년…“단종-정순왕후 만나게” 청원 등장
-
10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1
‘尹 훈장’ 거부한 교장…3년만에 李대통령 훈장 받고 “감사”
-
2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
3
“정파적 우편향 사상, 신앙과 연결도 신자 가스라이팅도 안돼”
-
4
[단독]“거부도 못해” 요양병원 ‘콧줄 환자’ 8만명
-
5
韓증시 아직 못믿나…중동전 터지자 외국인 5조원 ‘썰물’
-
6
‘암살자’ B-2 이어 ‘죽음의 백조’ B-1B 떴다…美 “이란 미사일시설 초토화”
-
7
나라 곳간지기에 與 4선 박홍근… ‘비명횡사’ 박용진 총리급 위촉
-
8
한동훈 “나를 탄핵의 바다 건너는 배로 써달라…출마는 부수적 문제”
-
9
전쟁 터지자 ‘매도 폭탄’, 코스피 5900선 붕괴…매도 사이드카 발동
-
10
조희대 “사법제도 폄훼-법관 악마화 바람직하지 않아”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전진우 칼럼]‘이승엽 홈런’이 유일한 樂인 세상](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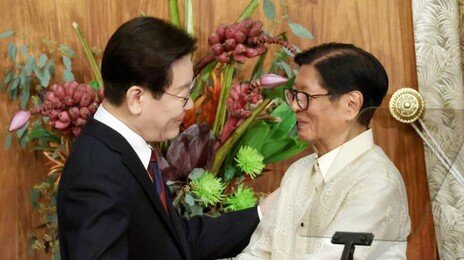

댓글 0